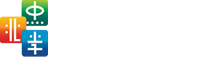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 명칭 | 송갑조(宋甲祚) |
|---|---|
| 분류 | 문신 |
| 시대/생몰년 | 1574년(선조 7)~1628년(인조 6) |
| 형태 | |
| 언어 | 한국어 |
| 지역 | 옥천 |
| 자료출처 | 옥천군지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원유(元裕)이고, 호는 수옹(睡翁)으로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옥천에 거주하였다. 참봉 송세량(宋世良)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봉사(奉事) 송구수(宋龜壽)이고, 아버지는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 송응기(宋應期)이며, 어머니는 광주이씨(廣州李氏)로 이윤경(李潤慶)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아버지이며, 최립(崔岦)의 문인이다.
송갑조는 1610년(광해군 10) 생원시(100명 중 36등)와 진사시(100명 중 75등)에 모두 합격한 수재형 인물이었다. 조선시대 소과의 일종인 생원시는 지금으로 치며 논술, 진사시는 경전 해석을 묻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한 직후 송갑조는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그는 같이 합격한 동과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목대비를 찾아 혼자 배알, 즉 인사를 드린 것이다. 당시 인목대비는 영창대군의 친모이나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서궁에 유폐된 상태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인목대비를 찾았다는 것은 여간한 강골이 아니고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즉각 파문이 일어났다. 같이 합격한 이영구(李榮久)란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동기생들이 그를 유적(儒籍)에서 삭제하는 운동에 나선 것이다.
효종실록에는 이 부분에 대해 “송갑조가 정사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나서 혼자서 서궁에 숙배를 하였다. 그 당시 흉도들이 폐모론을 주장하며 많은 선비들을 협박하였는데 갑자기 옷자락을 뿌리치고 가버리므로, 흉도들이 그의 성명을 탐문하여 중상할 계획을 썼다”고 적었다.
송갑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도 즉시 강하게 맞섰다. 벼슬에 추호의 미련도 두지 않고 명분에 맞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다. 송갑조는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 하게 써서 이를 반대자들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끝내 유적에서 제명되었다. 이는 벼슬길이 끊기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는 그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고향인 옥천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1623년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묵시적으로 협력한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그 결과 능양군이 등극하니 그가 바로 인조이다. 정국이 반전됐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인조는 송갑조를 종9품 강릉참봉(康陵參奉)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 때는 도보로 공주의 행재소까지 왕을 호종한 공로로 난이 평정된 뒤 다시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이 되었고 1627년(인조 5)에 종8품의 사옹원 봉사를 제수 받아 서울로 가는 도중에 청나라의 침입으로 남하하는 세자를 만나 완산(完山)으로 호종하였다. 뒤이어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비분을 이기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송갑조는 고작 참봉이나 봉사라는 종9품과 종8품의 최말단직에 머물고 말았다. 이에 효종 때 송준길(1606~1672)은 “윤리와 기강을 굳게 지킨 그의 기절은 숭상할 만한데도 인조 반정 이후 벼슬이라고는 고작 봉사에 그쳤고, 증직 역시 내려지지 않았으니 이는 부족한 은전입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자 승지 서필원이 효종에게 넌지시 아뢰길 “송갑조는 바로 송시열의 아비입니다”고 하니 효종이 “송시열은 그 아비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의 어짊은 유래가 있는 것이로다”하며 감탄하였다 한다.
영조 때에 이르러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한편 이원면 용방리 107번지에는 ‘수옹송선생유기비(睡翁宋先生遺基碑)’가 서 있다. 크기는 전고 126㎝, 비폭 38㎝, 두께 20㎝, 비갓폭 88㎝, 두께 63㎝, 높이 32㎝로 1914년[甲寅]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는 우암의 출생에 관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회덕에서 이원면 구룡촌으로 이사와 곽씨 문중으로 장가를 들었고, 이 곳에서 송시열을 낳고 키웠다고 하는 기록 등 송갑조 선생의 생애를 새긴 것이다.
또 송갑조가 살던 이원면 용방리 구룡촌을 지나 영동으로 가는 국도 변인 원동리 적등루 주변 산정에 이르면 작은 무덤과 비석 하나를 만날 수 있다. 비석은 높이 86㎝, 폭 41㎝, 두께 17㎝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에는 ‘贈領議政睡翁宋公 乳母憲菲之墓 子姜叟文墓在左 崇禎六十一秊 二月立(영의정으로 증직된 수옹 송공의 유모 헌비의 묘소이다. 그의 아들 강수문의 묘소는 좌측에 있다. 숭정 61년 2월에 세우다)’이라 새겨져 있다.
송갑조의 아버지 송응기(宋應期)는 이윤경의 딸인 광주이씨를 아내로 맞았는데, 어머니인 광주이씨가 연약한 몸으로 다섯 번째 아들인 송갑조를 출산한 후 네 살 때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어머니의 몸종으로, 시집을 올 때도 따라와 평생 주인을 모시던 헌비가 송갑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 키웠다. 송갑조는 헌비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당시 헌비에게는 또래 아들 강수문이 있었으나 둘은 허물없이 자랐다. 송갑조가 옥천으로 오자 헌비도 따라왔다. 그리고 헌비가 세상을 뜨자 양지바른 곳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 비석은 송갑조가 평소 송시열에게 헌비의 고마움을 누누이 강조했던 바 송시열이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가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던 해인 1689년 2월에 아버지 유모의 비석을 세워준 것이다.
이 묘비는 신분만을 내세워 노비의 절대적 희생을 강요하던 양반 계급사회에서 신분을 초월한 보은의 정표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적의 하나이다.
| 키워드 | 은진송씨, 수옹, 조선 중기 문신, 서궁 숙배, 송시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