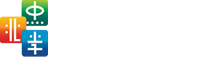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 명칭 | 강수(强首) |
|---|---|
| 분류 | 유학자 |
| 시대/생몰년 | ?~692 |
| 형태 | |
| 언어 | |
| 지역 | 충주 |
| 자료출처 | 충주시지 |
삼국통일기 신라의 유학자이며 대문장가이다. 처음 이름은 우두(牛頭 또는 字頭)이며, 내마(奈麻) 석체(昔諦)의 아들로 중원경(中原京, 지금의 충주)의 사 량(沙梁)에 살았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있어서 김유신(金庾信) 장군이 무력(武 力)으로 공을 세웠다면, 강수(强首)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문장으로 통일을 뒷받침한 분이다. 어머니의 꿈에 뿔이 돋친 사람을 보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머리 뒤에 높은 빼가 솟아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겨 현자(賢者)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니, 현자가 말하기를 “복희(伏羲)씨는 호형(虎形)이고, 여왜(女媧) 씨는 사신(蛇身)이며, 신농(神農)씨는 우두(牛頭)이고, 고도(皐陶, 순의 현자)는 마구(馬口)라 했으니 옛날 성현은 비슷하면서도 그 상(相)이 일반인과 달랐다. 관상을 보는 법에 얼굴의 사마귀는 나쁘나, 머리의 사마귀는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기이한 인물이 될 것이다”고 했다.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아이는 비상하니 잘 기르면 나라에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고 하며 잘 기르기를 당부했다. 강수는 자라면서 제 스스로 글을 읽고 그 뜻을 통달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기를 “네가 불도(佛道)를 배울 것인가, 아니면 유도(儒道)를 배우겠는가?'라 고 하니, “제가 들은즉 불도는 세상 밖의 교(敎)라고 합니다. 저는 속세의 사람인데 어찌 불도를 배우겠습니까, 유교의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고 했다. 아버지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라" 하고 뒷바라지를 했다. 강수는 스스로 유학을 선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자라고 하겠다. 불교보다 현세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도덕지상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으니,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신라에서 신분보다 도덕을 더욱 중요시했던 것이다. 강수는 일찍 이 부곡(釜谷)의 대장장이의 딸과 사귀어 정을 통하고 있었다. 나이 20이 되자 부모가 가문이 있는 집안의 규수로 하여금 장가들게 했으나, 재가(再嫁)는 옳지 않다고 하며,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바가 아니지만 도를 배우고 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바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조강지처는 버리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천한 아내라고 하여 차마 버릴 수는 없습니다”고 했다. 강수는 분명히 새로운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었다. 그가 내세운 도덕률은 유교적 실천도덕이었음을 알게 한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즉위하자 당나라의 사신이 조서(詔書)를 전해왔는데 그 중 알기 어려운 구절이 있었다. 왕이 강수를 불러 물으니 그는 한 번 보고 막힘이 없이 해석했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면서 서로 늦게 만난 것을 한탄 하고 그의 이름을 물으니, “신은 본래 임나가량(任那加良, 대가야) 사람으로 이름은 우두(牛頭)라 합니다” 고 하니, 왕이 이르기를 “경의 두골을 보니 강수(强首) 선생이라 일컬을 만하다”고 했다. 따라서 강수는 왕이 붙여준 이름이다. 왕은 조서에 회답(回答)하는 글을 짓게 했는데 문장이 훌륭하고 뜻이 분명했다. 왕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임생(任生)이라고만 했다. 후대의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임강수(任强首)라 기록하 고 있으며, 이후의 각 지리지는 모두 이와 같다)에 강수의 성을 임(任)이라고 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임생(任生)이라고 한 것은 임나(任那) 출신이라고 풀이해야 옳을 것으로 본다. 강수의 아버지가 석제(昔諦)이므로 석(昔)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 강수의 집안은 본래 임나(任那)가야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수는 일찍이 생계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집안이 가난하지만 태연 하므로 왕이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해마다 신성(新城)의 조(祖) 100석을 주게 했다. 문무왕 13년(673) 1월에 왕은 “강수는 문장으로 임무를 다하고 글(서한)로써 중국(中國)과 고구려·백제 두 나라에 뜻을 전했기 때문에 우호를 맺는 데 성 공했다. 우리 선왕(先王)이 당에 청하여 고구려·백제를 평정한 것이 비록 무공이라고 하지만 또한 문장도 도움이 있었으니 강수의 공을 어찌 소홀히 생각 할까 보냐” 하고, 사찬(沙飡)의 벼슬을 주고 녹봉을 더하여 해마다 조 200석으로 했다. 당(唐)의 야욕을 물리치기 위한 통일전쟁 기간 중인 문무왕 11년(671) 7월 26일에 당의 총관(摠管) 설인귀(薛仁貴)가 보내온 불신(不信)의 글에 대하여, 문무왕이 보낸 답설인귀서(答辭仁貴書)는 2440여자의 대문장으로 당당한 신라의 입장을 설명하여 설인귀를 압도했다. 이 글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었고, 강수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강수는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 때 죽었다. 장사를 지낼 때 나라에서 부의(賻儀)로 옷감을 후하게 주었다. 그러나 집안사람들은 이를 사사로이 취급 하지 않고 불사(佛事)에 보냈다. 또한 그의 아내가 생활이 어려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대신(大臣)이 알고 왕에게 청하여 조 100석을 주게 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사양하면서 “첩은 천한 사람으로 의식을 남편에 의지했으며, 나라의 은혜를 입은 바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미 혼자의 몸이 되었는데 어찌 감이 다시 후한 사물(賜物)을 받겠습니까” 하며, 끝내 받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과연 강수에게 적합한 아내였음을 알게 한다. 충주에서는 우륵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강수(强首)의 추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강수백일장을 베풀고 있으니 젊은 학생들에게 문장력을 길러주고자 하 는 뜻이다.
| 키워드 | 강수, 우두, 중원경, 사량, 태종무열왕, 답설인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