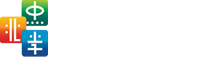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 명칭 | 이시발(李時發) |
|---|---|
| 분류 | 문신 |
| 시대/생몰년 | 1569 ~ 1626 |
| 형태 | |
| 언어 | |
| 지역 | 진천 |
| 자료출처 | 진천군지 |
조선(朝鮮) 중기의 문신(文臣)이다. 진사(進士) 이대건(李大建)의 아들로 청원군(淸原郡) 오창면(梧倉面) 오근리(梧根里)(장터)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양구(養久)이며 호(號)는 벽오(碧梧) 또는 후류어은(後類漁隱)이라 하였으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여섯 살 때 아버지와 사별(死別)하고 성장하면서 서계(西溪) 이득윤(李得胤)에게 학문을 익혔다. 1589년(선조 22)에 증광(增廣)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고향의 어머니를 산곡문(山谷問)에 피신시키고 청주(淸州)의 의병장(義兵將) 박춘무(朴春茂)를 찾아가 협력하였다. 이듬해에 의주(義州)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서울이 탈환(奪還)되었는데도 환도(還都)를 주저하고 있을 때 “서울이 수복(收復)된 이상 빨리 서울로 환도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장병(將兵)과 군비(軍備)를 정돈하여 왜적(倭賊)을 완전하게 격퇴시켜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이때에 심희수(沈喜壽)도 그 훌륭한 문장(文章)과 적절한 시국판단(時局判斷)에 감탄하고 왕에게 품신하여 환도(還都)케 하였다. 도체찰사(都體察使) 류성룡(柳成龍)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1593년 가을에 이항복(李恒福)이 이시발(李時發)의 방지책략(方智策略)에 감탄하여 선조에게 품신하여 경주(慶州)에 주둔하고 있는 명장(明將) 노상지(路尙志)의 접반관(接伴官)으로 삼아서 병법(兵法)을 배우게 하였다. 노상지도 그의 재능(才能)을 칭찬하여 매사를 상의하게 되었다. 이시발은 병법뿐만 아니라 명의 언어(言語), 사정(事情), 예규(禮規)에도 정통하게 되었다. 상지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선조에게 추천하되 크게 기용하라고 하였다. 이어 전적(典籍)·정언(正言) 등을 거쳐 병조좌랑(兵曹佐郞)이 되었다. 1595년(선조 28) 일본(日本)과의 강화교섭(講和交涉)차 명의 유격장군(遊擊將軍) 진홍운(陳鴻雲)이 왜장(倭將)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진영(陣營)으로 들어갈 때 이시발이 동석(同席)하여 적정(敵情)을 살피고 돌아와 이듬해에 복명하고 병조정랑(兵曹正郞)이 올랐다. 어사(御使)가 되어 호남지방(湖西地方)을 안무(按撫)하였다. 1596년(선조 29) 10월에 이몽학(李夢鶴)이 홍산(鴻山)에서 반란(反亂)을 일으켰다. 이시발은 갖고있는 부병(部兵)을 이끌고 나가 토평(討平)한 공으로 장낙원정(掌樂院正)에 승진되었다. 이를 시기하는 자 있었으나 선조는 그들을 물리쳤다. 이시발은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았다. 그러나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불러서 종사(從事)하게 되었다. 겨울에 찬화사(贊畵使)가 되어서 충주(忠州)의 덕주산성(德周山城)을 쌓고, 또한 조령(鳥嶺)에 설(設)하고 루(壘)를 조영(造營)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분조(分朝)의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어 명나라 원병(援兵)에 대한 군량미의 보급을 맡았다. 이어 경상감사(慶尙監司)가 되었다. 1599년(선조 32) 봄에 또다시 영남(嶺南)을 순무(巡撫)하였으나 이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물러나와 성주목사(星州牧使)를 거쳐서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다. 이에 어질고 밝게 정사를 잘 다스렸으므로 생업(生業)에 안착(安着)케 하는 등 치적이 현저하므로 1601년(선조 34)에 승진하여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가 되어 임기(任期)를 유임하여 있기 4년이었다. 1604년에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북변(北邊)의 경계가 필요하므로 함경도(咸鏡道) 관찰사(觀察使)에 천거되었다. 이시발은 이곳에 나아가 진보(鎭堡)·포루(砲樓)·성곽(城郭)을 수보(修補)하여 모두 새롭게 하 였으므로 형세가 정돈되고 매우 굳게 다져졌다. 가을에 예병조참판(禮兵曹參判)이 되었다. 1608년(광해군 1) 서북변(西北邊)에 여진인(女眞人)이 침입하여 민심이 소란하니 이를 진무(鎭撫)키 위하여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어 나가 그들을 무마하여 평온케 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하여 치정(治政)이 혼탁해지자 이시발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1909년 광해군의 책봉사(冊封使)가 오게 되자 명과의 교빙사정(交聘事情)에 밝은 이시발을 어전통사(御前通事)(어전통역관(御前通譯官))로 불렀다. 이어 관군국제무(管軍國諸務)를 삼았다가 다시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주사대장(舟師大將)을 삼았다. 1612년(광해군 4)에 김직재(金直哉)의 역모옥사(逆謀獄事)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하루 만에 석방되고 관직이 삭탈되었다. 1614년에 다시 기용(起用)되었으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했다가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은퇴했다. 1618년에 파주목사(坡州牧使)가 되었다. 양사에서 정청(庭請)에 참여치 않은 자들을 탄핵하자 또다시 벼슬을 버리고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으로 들어가 정자(亭子)를 짓고 한가로이 지내면서 후영어은(後穎漁隱)이라 자호(自號)하며 살았다. 1619년(광해군 11)에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都元帥)로 삼아 요동(遼東)으로 진군(進軍)케 하였다. 이때에 체찰사(體察使) 장만(張晩)이 안주(安州)에서 병을 얻어 누우니 이시발을 다시 불러 특명으로 오도참화사(五道參畫使)를 삼아 장만을 돕게 하였다. 이듬해 이시발은 관서(關西)지방에 이르러 외세(外勢)(누루하치)에 대비할 방략을 건의하고 관서지방에 수십 개의 진영(鎭營)을 설치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진정하였으니 공부(貢賦)를 줄이고 민력(民力)을 기르도록 청하였으며 군병(軍兵)을 점검하고 널리 둔전(屯田)을 마련하여 병량(兵糧)을 충족케 하였다. 또한 안변(安邊)의 위급함을 진정하였다. 광해군은 상방창(尙方創)을 하사하며, 대장(大將) 이하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이것으로 처리하라 하였다. 이때에 척리(戚里)의 친척(親戚)인 옥강만호(玉江萬戶) 변일(邊溢)이 호병(胡兵) 100여 기를 보고는 성(城)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이시발이 변일을 잡아 죽여 군기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책임을 추궁하니 이시발은 병을 핑계 삼아 사직하고 물러났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자 다시 기용되어 수국유사당상(修局有司堂上)에 겸하여 지의금부(知義禁府)와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에 임명되어 북방의 외침(外侵)에 대비한 연병지책(練兵之策)을 실시케 하였다. 뒤이어 한성판윤(漢城判尹)에 등용되고 다시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이듬해에 이괄(李适)이 반(反)하자 체찰부사(體察副使)가 되어 군병(軍兵)을 이끌고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으로 가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괄은 사잇길로 서울을 진격하여왔다. 이에 이수일(李守一)・장만 등과 합세하여 격파하고 성내(城內) 인심(人心)을 안정시켰다. 인조는 공주까지 파천(播遷)하였다가 돌아와서 그의 전공(戰功)을 치하하여 백금대(白金帶)를 하사하였다. 이시발은 그 뒤에 청(淸)의 세력(勢力)이 강대해지면서 태도가 점차 수상하여지자 만일의 경우를 염려하여 강화도(江華島)의 군비시설(軍備施設)을 정비강화(整備強化)하였으며, 다시 삼남(三南)의 도검찰사(都檢察使)가 되어 삼남지방(三南地方)의 군비상황(軍備狀況)을 검찰(檢察)하고, 또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축(修築)하는 등 그 치적(治績)이 많았다. 그는 남한산성의 역사(役事)를 감독하다 죽었다.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고 충익(忠翼)이라 시호하였다. 저서(著書)로는 《주변녹(籌邊錄)》, 《오유고(梧遺稿)》가 있다. 이시발은 총명하고 영특하였으며 일에 당하여는 의구심으로 지체하는 일이 없이 처음부터 정하여진 해동의 규모대로 잘 처리하였다. 또한 위난에 처할 때마다 여러 차례 중임을 맡아 좌주우응(左洲右應)하여 판단하고 처리하는 솜씨가 흐르는 물과 같았다 한다. 지금 묘소는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지천에 그의 아버지 오촌(梧村) 이대건(李大建) 묘하(墓下)에 있다. 1658년(효종 9)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으니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하고, 송준길(宋浚吉)이 글씨를 쓰고, 이정영(李正英)이 전(篆)하였다.
| 키워드 | 이시발, 임진왜란, 정유재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