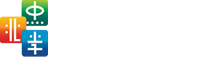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 명칭 | 정철(鄭澈) |
|---|---|
| 분류 | 문신 |
| 시대/생몰년 | 1536 ~ 1593 |
| 형태 | |
| 언어 | |
| 지역 | 진천 |
| 자료출처 | 진천군지 |
조선(朝鮮) 전기의 시인(詩人)이며 문신(文臣)이다. 判官 鄭惟沈의 넷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계함(季涵)이며 호는 송강(松江)이라 하였고,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그의 맏누이가 인종(仁宗)의 귀인(貴人)이며, 둘째 누이가 계림군(桂林君) 류(瑠)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궁중에 드나들어 뒤에 명종(明宗)이 된 경원대군(慶原大君)과 친숙했었다.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乙巳士禍)에 계림군이 관련되자 그의 일족(一族)으로서 맏형인 정자(鄭滋)는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는 유배(流配)를 가게 되었다. 이때 정철은 유배지로 아버지를 따라 다녔다. 1551년(명종 6)에 특사되어 온 가족이 고향인 전라도(全羅道) 평창(平昌)으로 낙향하여 살았다. 정철은 성산(星山) 기슭의 송강(松江)과 기암누정(奇岩樓亭)과 대숲 등을 벗 삼고 10년 동안 여기에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등 당대의 석학(碩學)에게 학문을 익혔으며, 양응정(梁應鼎)·김윤(金允)·임억령(林億齡)·송순(宋純) 등에게도 글을 배웠으며 자라면서는 이이(李珥)·성혼(成渾) 등과도 교우(交友)하였다. 1561년(명종 16)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였다. 지평(持平)·전적(典籍) 등을 역임하고 1566년(명종 21)에 직강(直講)·헌납(獻納)·지평(指平)을 거쳐 함경도(咸鏡道) 암행어사(暗行御史)를 지낸 뒤에 이이와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568년(선조 1)에 수찬(修撰)·교리(校理)를 거쳐 다시 지평이 되었다. 이때에 김개(金鎧)·홍담(洪曇) 등이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사림(士林)들을 물리치고자 경석(經席)에서 왕에게 아뢰었다. 이에 정철이 김개가 왕을 현혹하게 하여 사림을 해치려하니 왕께서는 깊이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김개의 과실을 들추어 통렬하게 지적하니 김개의 안색이 흙빛이 되어 물러갔다. 이에 삼사(三司)가 다투어 탄핵하여 김개의 관직을 삭탈하고 내쫓았다. 1575년(선조 8)에 동서(東西) 분쟁(分爭)에서 동인(東人)의 시기에 따라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갔다. 1578년에 장낙원정(掌樂院正)으로 기용되고 사련(司鍊)·집의(執義)·직제학(直提學)을 거쳐서 승지(承旨)에 올랐다. 이 때에 진도군수(珍島郡守) 이수(李銖)의 뇌물사건으로 동인의 공격을 받아 사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1580년(선조 13)에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로 등용되고, 그 후 3년 동안 지방장관(地方長官)으로서 보다는 한 사람의 시인(詩人)으로서 그의 천재적 재질을 나타낸 작품을 썼다. 그의 최초의 가사(歌辭)(관동별곡(關東別曲))은 금강산(金剛山)을 비롯한 관동구경(關東八景)을 두루 유람하면서 산수(山水)를 노래하고 또한 고사(故事)·풍속(風俗)까지 삽입한 것이며, 〈훈민가(訓民歌)> 16수(16首)는 백성을 교화(敎化)함에 있어서의 포고문이나 유시문을 대신하여 시조(時調)의 형식을 빌어 지은 것이다. 1583년(선조 16)에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고, 이어 형조와 예조의 판서(判書)를 역임하였다. 이 때에 박근원(朴謹元)이 이이·박순(朴淳) 및 성혼에게 감정을 품고 모함하므로 정철은 홀로 박근원 등 소인배들에게 분명히 그 행위의 진부(眞否)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귀양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김우제(金宇題)이 정철을 탄핵하니 왕이 친히 대답하기를 “정철은 그 마음이 바르고 그 행동이 방정하며 그 말이 곧기 때문에 당시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직분에 진력함과 충성스럽고 청백한 절의(節義)는 초목(草木)도 또한 아는 바이니 참으로 반열(班列)의 악(鶚)이요, 전상(殿上)의 맹호(猛虎)이다. 만약 정철을 죄 준다면 이는 주운(朱雲)을 벨 수 있다는 것이 된다.”고 두둔하여 그의 충절(忠節)을 칭찬하였다. 1584년(선조 17)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나 동인의 논척(論斥)으로 이듬해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4년 동안 가사생활(家事生活)에 들어갔다. 이 때 <사미인곡(思美人曲)>·<속미인곡(續美人曲)〉·〈성산별곡(星山別曲)> 등 수많은 가사와 단가(短歌)를 지었다. 1589년에 우의정(右議政)으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謀反事件)을 다스리게 되자 서인(西人)의 영수(領首)로서 철저하게 동인들을 추방했다. 이를 기축옥사(己丑獄事)라 한다. 이 해에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공을 세웠으므로 광국공신(光國功臣)이 되었으며, 정여립이 난을 평정한 공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체록되었으며,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에 봉(封)해졌다. 이듬해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1591년에 건저문제(健儲問題)를 제기하게 되었다. 정철은 영의정(領議政)이며 동인이었던 이산해(李山海)와 함께 광해군(光海君)을 세자(世子)로 책봉할 것을 약속하고 왕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산해는 왕의 뜻이 신성군(信城君)에 있음을 알고, 신성군의 외숙(外叔)인 김공양(金公諒)과 결탁하여 김빈(金嬪)(신성군의 모(母))에게 정철이 건저를 청하여 신성군를 죽이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김빈이 왕에게 읍소(泣訴)하여 왕의 격분을 사게 되었다. 그 후 이산해의 꾀에 빠진 정철이 홀로 왕에게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하게 되자 크게 노여움을 사고 파직되어 진주(晋州)로 유배되었다가 강계(江界)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기축옥사 때 정철에게 원한을 품었던 동인들의 보 복이었던 것이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서울을 버리고 의주(義州)로 몽진하게 되었다. 개성(開城) 남문(南門)에 어가(御駕)가 이르자 부노(父老)들이 정철을 불러들이도록 원하였다. 왕은 즉시 정철을 석방하도록 하고 행재소(行在所)로 오도록 하였다. 왕의 부름을 받고 귀양에서 풀려나와 의주까지 호종(扈從)하였다. 왜군들이 아직 평양 이남을 점령하고 있을 때 경기·충청·전라도의 체찰사(體察使)를 지냈다. 체찰사가 되어 배를 타고 황해도 해변을 지나다가 연안쪽으로 총소리가 지축을 울리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 성중(城中)의 인명(人命)을 생각하여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장연(長淵)에 이르러서는 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이 패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位)를 설치하고 통곡하며 슬피 시를 읊으니 「10월에 금산사(金山寺)에 오르니 삼추고국(三秋故國)의 마음이다. 밤에 조수(潮水) 시원한 기운을 나누고 돌아가는 기러기의 슬픈 소리 들린다. 적이 있으니 자주 칼을 보고, 사람이 죽었으니 거문고 줄 끊고 싶다. 평생 애송하던 출사표(出師表)를 난을 당하 여 다시 길게 읊노라」고 하였다. 1593년에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얼마 후 동인들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강화(江華)의 송정(松亭)에 우거(寓居)하면서 만년(晚年)을 보내다가 이곳에서 58세로 별세하였다. 처음에는 고양(高陽)에 안장(安葬)하였다가 1665년(헌종 6)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묘지를 진천군(鎭川郡) 문백면(文白面) 봉죽리 환희산(歡喜山) 동쪽에 잡아서 이장(移葬)하고 사우(祠宇)도 세웠다. 사우는 1973년에 보수하고 1979년에 전면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우 입구에는 신도비(神道碑)도 있으며 묘소 입구에는 1968년에 한국국어교육학회(韓國國語敎育學會)와 청주국어국문학회(淸州國語國文學會)에서 세운 송강시비(松江詩碑)가 있다. 당대 가사문학(歌辭文學)의 대가(大家)로서 시조의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와 더불어 한국(韓國) 시가사상(詩歌史上) 쌍벽으로 일컬어지는 시인이며, 서인의 영수였던 그는 죽은 후에 관작을 추탈당했다. 1609년(광해군 1)에 신원(伸寃)되고 1623년(인조 1)에 관작이 복구되었다. 창평(昌平)의 송강서원(松江書院), 연일(延日)의 오천서원(烏川書院), 별사(別祠)와 진천(鎭川)의 송강사(松江祠)에 제향(祭享)되고 있다. 저서에는 《송강집(松江集)》, 《송강가사(松江歌辭)》, 《송강별추록유사(松江別追錄遺祠)》가 있으며, 작품으로는 시조 70여 수가 전한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 키워드 | 정철, 관동별곡, 건저문제, 사미인곡, 송강집, 송강가사, 송강별추록유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