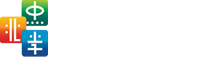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 명칭 | 문백면 은탄리 은재마을 동제 |
|---|---|
| 분류 | |
| 시대/생몰년 | 조선~2010년대 초반 |
| 형태 | 당사,장승 |
| 언어 | |
| 지역 | 진천 |
| 자료출처 |
은탄리 은재마을은 2010년대 초반까지 매년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산제와 장승제를 지냈다.
은재마을 동제는 6.25때 단절되었다가 1984년 산신제만 복원하여 2010년대 초반까지 계승하였다.
산제장은 불당산에 위치하며, 제장은 벽돌로 지은 당사로 구성되어 있다. 산제당은 초가 형태였다가 1970년 정부 시책에 따라 훼철되었다. 이후 벽돌로 산제당을 다시 짓고, 산제당 안에 제기 등 기물을 보관하였다.
장승제장은 은탄리 은성 청룡산 장승께에 위치하며, 암석과 제단, 소나무, 매년 세우는 장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재마을은 매년 정월 곧은 소나무를 골라 장승 2기[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를 깍아 세웠다. 장승은 윤병억 씨가 맡아 깍았다. 은재마을 장승은 타 지역보다 작고, 관을 쓴 얼굴에 이빨을 드러낸 초상으로 머리에 흰색의 무명포를 두른 것이 특징이다.
제주는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3명을 선출했다. 선출된 제관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렸다. 동네 어귀에도 금줄을 쳤다. 2000년대에는 금줄치기가 생략되었다.
제수는 신격별로 차이가 있다. 산제에는 돼지머리와 발목 4개, 삼색실과, 백설기, 밥, 술을 올렸다. 돼지머리는 통돼지에서 변경된 것이다. 장승제에는 팥시루떡 한 시루, 북어, 명주 등을 올렸다.
은재마을은 산제의 제수 진설 방향을 신이 있는 북쪽으로 놓는 특징이 있다.
제사 차례는 산제 후 장승제 순으로 올렸다. 산신제는 유교식 차례에 준하여 진행하며, 제사 중 참사자들의 금언 금기가 있었다.
장승제는 제를 지내기 전 장승 주변에 황토를 뿌려 부정을 금했다. 제수 진설 뒤 헌작 재배 순으로 올렸다.
장승제를 지낸 뒤 동네 주민들이 풍물을 치며, 윷놀이 등 대보름놀이를 즐겼다.
| 키워드 | 은탄리 은재마을 산신제, 장승제,은성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