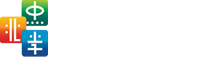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 명칭 | 초평면금곡리 금한 천제 |
|---|---|
| 분류 | |
| 시대/생몰년 | 조선~현재 |
| 형태 | 구형의 자연형 제단,참나무 |
| 언어 | |
| 지역 | 진천 |
| 자료출처 |
금곡리 금한마을은 현재까지 3년마다 11월 15일에 천제를 올린다. 원 제일은 음력 정월에 길일을 택해 지냈다.
금한마을 천제는 광산김씨 진천 입향조인 김종길의 입향으로 시작되어 약 350년의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 고령화 등으로 1992년 단절되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김용기 씨가 복원에 힘을 써서 2009년 진천군 지원을 받아 기관 행사 성격으로 복원되었다.
현재 금한동천계문부(琴閑洞天契文簿)와 홀기, 축문 문서 등 천제 관련 문서가 전한다. 이 중 홀기(笏記)와 고천문(告天文), 진설도(陳設圖)는 증손 김진광이 지었다고 한다. 전해지는 천제 홀기는 1909년 후손인 김항백이 다시 등초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천제홀기(天祭笏記)의 오른쪽 아래에 기록된 “기유정월십육일등초(己酉正月十六日騰抄)” 구문으로 알 수 있다.
금한마을 천제장은 마을 뒷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다. 천제장은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타원형의 제단과 그 주변을 둘러싼 참나무 4그루로 구성된 자연형 제장 형태이다.
제관은 생기복덕에 맞춰 제사 삼일 전에 부정 타지 않은 정갈한 사람으로 5~7명을 뽑는다. 헌관 3명, 축관 1명, 집사 1명, 알자[헌관 인도자] 1명, 사준[제주 담당자] 1명 등이다.
선출 제관들은 3일 정성으로, 목욕 재계를 하고 의관을 갖춘 뒤 미역과 흰 쌀밥으로 식사하며 근신한다.
제관 중 2명이 천제 3일 전에 누룩과 쌀을 비벼 천제에 쓸 술을 빚는다. 제주는 제장 아래 묻었다가 전날 밤에 걸려 사용한다.
천제 3일 전에는 마을 입구마다 백지 꽂은 왼새끼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 당일에는 제관들이 제장에 올라가 가장 큰 참나무 앞에 편편하게 돌을 쌓고 자연목을 얹어 단을 제설하고 준비초막을 만든다. 또한 모닥불을 피워 제수를 마련한다. 이 모닥불이 마중시루의 횃불로도 쓰인다.
제수는 돼지머리와 돼지발목 4개, 메, 술, 포, 나물 등을 올렸다. 천제 홀기의 진설도에 따르면, 희생물로 사슴과 토끼를 삼는데, 대체물로 꿩을 쓴다고 나와 있다.
제사는 제수를 진설할 뒤 자시인 밤 12시에 시작한다. 제사가 시작되면 참사자 중 한 명이 횃불을 휘둘러 제사의 시작을 알렸는데, 초청한 궁사가 화살을 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사 차례는 분향강신(焚香降神)-납폐(納幣)-헌작(獻爵)[초헌, 아헌, 종헌]-독축(讀祝)[초헌 때]-재배(再拜)- 음복례(飮福禮)-소축(燒祝)-철찬(撤饌)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금한 천제에는 일반 축문과 함께 역병일 돌 때 별도로 첨가하는 역병 축문이 있다.
천신제를 올리는 동안 마을에서는 마중시루를 올린다. 산에서 횃불을 휘둘러 천제의 시작을 알리면 마을에서도 윗동네와 아랫동네에서 횃불을 휘둘러 각 가정에 동제의 시작을 알렸다.
가정의 마중시루는 장독대, 마당 등 집안의 넓고 깨끗한 장소에서 올렸다.
마중시루 제수는 3되 3홉으로 찐 떡시루와 정안수이다. 떡시루에는 명주실 다발을 두른 북어를 꽂았다. 현재 마중시루는 3말 3되로 큰 시루 7개를 쪄서 금한정에 놓고 참여한 주민이 함께 비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 다음날 칠순이 넘은 마을 어른들에게 돼지고기를 봉송한다. 천제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복한다.
| 키워드 | 금한동 천제,금한동 천계문부(琴閑洞天契文簿),천제 홀기(笏記),고천문(告天文),김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