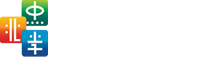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망선루(望僊樓) |
|---|---|
| 분류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
| 시대/생몰년 | |
| 형태 | |
| 언어 | |
| 지역 | 청주 |
| 자료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
객관(客館) 동쪽에 있었는데, 옛 이름은 취경루(聚景樓)이다. 지정(至正) 신축년(공민왕 10년)에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紅巾賊)을 피하여, 안동(安東)으로부터 이곳에 옮겨 와 수개월 동안 머물렀었다. 도적이 평정되자 문과와 감시(監試)의 합격자 방을 붙였었는데, 훗날 사람이 그 방을 써서 누각에 게시하였다. 누각은 오랫동안 헐어 있었는데, 천순(天順) 신사년(세조 7년)에 목사 이백상(李伯常)이 새로 중수하고, 한명회(韓明澮)가 누각의 편액을 고쳐서 ‘망선루’라 하였다.
『신증』 이의무(李宜茂)의 부(賦)에, “이 누에 올라 쉬노라니, 먼 변방까지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그지없이 넓은 하늘을 바라보니, 문득 마음은 넓어지고 정신은 평온해진다. 먼지의 어둡고 흐릿한 것을 지나치니, 초연(超然)히 원대한 생각이 피어오르네. 봉래산(蓬萊山)을 지척에 바라보니, 환패(環珮)의 달그락 소리 들리는 듯하여, 문득 범골(凡骨)이 한 번 허울을 벗으니, 사뭇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성싶구나. 명월(明月 달과 야광주(夜光珠)의 두 가지 뜻)로 꾸며 관(冠)을 만들고, 청운(靑雲 구름과 벼슬의 두 가지 뜻)의 옷을 입고 활짝 꽃을 피우도다. 봉황새로 하여금 먼저 중매하게 하고, 파랑새를 시켜서 인사하게 하라. 천제의 궁궐에 나아가 머리 조아리니, 진인(眞人)의 풍모를 지녔구나. 뭇 계집이 나의 아리따움을 시기하여, 도리어 나를 가리켜 무지개[蝀螮]라 하네. 이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버리려 하여도 안 되며, 마음을 낮추고 얼굴을 취하려 해도 그것 또한 나의 재주가 아니로다. 해는 져서 장차 함지(咸池)로 들어가려 하니, 꽃다운 것을 모두 잡아서 쉬게 하도다. 노복(奴僕)은 말[馬] 생각을 안타깝게 하여 우두커니 서서 돌아만 보네. 가는 길이 더디고 더딤을 한탄하노니, 큰 들은 아득히 평평하기만 하도다. 짐승들은 바삐 뛰며 무리를 찾고, 새들은 날다가 지쳐 날개를 걷는다. 그윽하고 곧음이 처신할 곳인 줄 깨달았으니, 동서와 남북을 헤매어 무엇하리오. 신선 살이를 바라는 것은 분수가 아니니, 나는 장차 전원(田園)에서 할 일이 있노라. 강산을 어루만지며 노니나니, 풍월을 즐기며 글 읽는 소리로다. 날마다 하는 일 없이 유유자적하노니, 노담(老聃 노자(老子))을 본받고 장주(莊周 장자(莊子))를 소망하도다. 이 즐거움 바꿀 것이 없으니, 어찌 내가 한 고을에서 답답히 지낸다 하리오.” 하였다. 쇄(誶 졸장(卒章))에 이르기를, “기장이 풍년들고 보리가 한 줄기에 두 이삭씩 팼으며, 나의 들과 질퍽한 들에 고기 살찌고 나물 또한 향기로우니, 나의 맛있는 반찬이로다. 진실로 내 여기 삶이 즐거우니, 여기서 늙어 죽은들 무슨 한 있으리. 신선들에게는 따라 미치지 못할망정, 내 스스로 갈천씨(葛天氏)의 태평성대에 비기노라.” 하였다.
○ 양희지(楊熙止)의 시에, “마을에 부슬비 내리고, 절에서는 저녁 종소리 울리기 시작하도다. 이끼 낀 벽에 달팽이 지나간 자국 글자를 이루었고, 모래층 뜰의 새 발자국은 전서(篆書)로구나. 못은 깊어 바닥까지 깨끗하고, 누각은 높아서 훤하게 트이었도다. 임금 수레 가신 뒤 소식 없고, 귀뚜라미 울음 소리 나에게 하소연하는 듯하구나.” 하였다.
[여지도서] 望仙樓(在客館東舊名聚景至正辛丑高麗恭愍王避紅賊自安東移駐此州數月及賊平放文科及監試榜後人書其榜揭于樓樓壞久天順辛巳牧使李伯常重新韓明澮改扁曰望仙)
| 키워드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