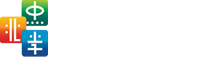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공북루(拱北樓) |
|---|---|
| 분류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
| 시대/생몰년 | |
| 형태 | |
| 언어 | |
| 지역 | 청주 |
| 자료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
고을 북쪽 3리에 있다.
○ 백문보(白文寶)의 응제시(應製詩 임금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 서문에, “때는 신축(辛丑)년, 임금의 수레가 복주(福州 안동)로부터 상주(尙州)를 거쳐 옮겨와, 행궁(行宮)이 청주(淸州)에 머무르게 되었다. 임인년 가을 9월 19일에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하정표(賀正表)를 청주 교외(郊外)에서 올리고, 이어 공북루에 납시어 일재(一齋) 권한공(權漢功)이 전에 지은 오언절구(五言絶句)를 보시고, 즉시 지신사(知申事) 원송수(元松壽), 대언(代言) 이색(李穡), 성사달(成士達)에게 명하여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에 좌정승 홍양파(洪陽坡), 이행촌(李杏村)ㆍ황회산(黃檜山) 및 여러 대부(大夫)와 선비들이 모두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쳤다. 백문보는 그때 마침 왕명을 받들고 서울에 가고 없었는데, 이 일을 듣고 매우 부러워 목을 내밀고 바라보면서, 신은 성사(盛事)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부름을 받고 돌아오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도 화답하는 시를 지어서 그들의 끝부분에 붙여 놓는 것도 다행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 고을의 원 김성갑(金成甲)이 유사암(柳思庵 유숙(柳淑))의 말로써 부탁하기를, ‘임금의 명을 받들어 지은 시가 완성되어 장차 현판에 새기려 하는데, 서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백문보가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다가, 한 번 쓰면 영원히 전할 것으로 여겨 드디어 붓을 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옛날에 임금과 신하가 함께 노래를 지어 읊조린 것은, 본래 태평한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난리통에 어지러워, 그런 상황에서 어찌 오늘 같은 성대한 일이 있으리라 여겼겠습니까. 아, 우리 전하께서 대국을 공경하여 섬기는 그 정성이 공북(拱北 북극성을 향한다는 뜻임)이라 이름 지은 이 누각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시에 이르기를, ‘공북의 이름은 비록 오래 되었으나, 우리 임금께서 공경의 뜻을 나타낸 것은 이것이 처음이로다. 먼지는 이제 말끔히 씻겼으니, 풍물을 이제 바로 써야겠도다. 임금 계신 곳 멀리 우러러보고, 시내와 들은 앞 뒤로 훤히 틔었도다. 이 백성들 임금 은혜 느낄 줄 아니, 책임은 나 한 사람[一人予]에게 있으리.’ 하였다.” 했다.
○ 고려 권한공(權漢功)의 시에, “공북루를 새로 지은 것은 경신년 10월 초순인데, 지은 시는 권찬선(權贊善)부터이고, 공은 윤상서(尹尙書)로부터다. 옛 길은 단풍 든 나무 사이로 뻗었고, 맑은 못에는 푸른 하늘이 거꾸로 비치도다. 머뭇거리어서 해는 지려는데, 산 빛은 나의 시름을 자아내누나.” 하였다.
○ 고려 신천(辛蕆)의 시에, “고을과 산천이 좋으니, 백성이 태고의 풍속을 즐기네. 좌중의 손님들은 전의 내한(內翰)이었고, 목사는 옛 중서(中書)로다. 소나무ㆍ참나무 우거진 봉우리가 빼어났고, 뽕나무와 삼을 심은 들판이 툭 트이었도다. 난간에 의지하여 시를 읊으려 하니, 수풀에 새들이 나를 재촉하는구나.” 하였다.
○ 고려 원송수(元松壽)의 시에, “경치 좋은 이 누에 올라, 맑은 날 처음 응제(應製)하네. 오늘의 총애 기꺼이 받으나, 옛 사람의 글을 잇기 부끄럽구나. 길은 남녘으로 곧바로 틔었는데, 산이 머니 북녘은 훤히 비어 있구나. 예천(醴泉)이 즐겁게 놀기 좋으니, 영광이 나 같은 이 없도다.” 하였다.
○ 이색(李穡)의 시에, “임금님 수레 이른 새벽에 움직이니, 문물이 태평할 시초로다. 누각이 높아 하늘 보기 가까운데, 임금님 분부 받들어 시를 이루네. 산 빛에 기쁨이 생기고 가을 기운은 충허(沖虛)를 모으도다. 뒷날 남녘으로 순행(巡幸)하실 때, 함향(含香)이 나에게도 있으리.” 하였다.
○ 성사달(成士達)의 시에, “이 해도 다하여 날씨도 쌀쌀해지려는데, 임금님 모시고 누대에 올라 붓을 적시어 옛글에 화답하노라. 가을은 깊어 연꽃 떨어져 버리고, 바람 설레는 나무 그늘도 공허한데, 임금 모시는 영광 속에서도 오히려 나는 부끄러워 망설이도다.” 하였다.
○ 홍언박(洪彦博)의 시에, “임금님 모신 수레 동쪽으로 돌아오던 날, 가을 바람에 나뭇잎이 지기 시작하였네. 강산은 나더러 머물러 있으라 하고, 시구는 남의 글을 빌려서 썼도다. 길은 곧아 멀리 남녘에서 조회(朝會)하고, 누각은 높아 허공의 북두성을 향하네. 늙어서도 항상 임금 모시니, 벽 위에 적을 내 이름 잊지 말라.” 하였다.
○ 고려 이암(李嵒)의 시에, “옛 고을에 누각이 우뚝한데, 누가 처음 지었을까. 가을 빛은 온 산의 나무들에 짙고, 풍경은 두어 줄의 글에 들어오도다. 멧부리는 서쪽을 바라보기에 좋고, 푸른 구름은 빈 북녘을 메웠도다. 누에 올라 시종(侍從)에 참여하니, 그 영광 스스로 부끄럽네.” 하였다.
○ 이제현(李齊賢)의 시에, “나라 남쪽을 두루 살피시던 날, 표(表)를 북루에서 처음 올렸소. 술통 앞에 호탕히 흥이 겨워, 거침 없이 붓을 놀려 글을 쓰노라. 바람은 높아 기러기 물가를 따르고, 구름은 맑은데 학은 허공을 날도다. 늙어가매 이제 병이 많으니, 임금 은혜, 슬퍼하는 나를 저버리려는가.” 하였다.
○ 고려 황석기(黃石奇)의 시에, “공북루 좋다고 하나, 임금이 오시긴 이번이 처음이네. 못 경치가 그지없이 좋으니, 어찌 벽 위에 쓸 수 있으리오. 누각에 올라 보니 넓어서 좋고, 쳐다보니 참으로 시원하구나. 예천상(醴泉相) 고맙기도 하구려, 시를 남겨 나를 상기시키네.” 하였다.
○ 유숙(柳淑)의 시에, “공북루에 임금 모시고 관상하는 날은, 나라가 중흥(中興)하는 시초로다. 훌륭한 일 장차 전해 보이려고, 굳이 새 시를 스스로 쓰노라. 깃발은 길에 가득 휘날리고, 곤룡포(袞龍袍)는 멀리 허공에 임했도다. 이곳이 비록 즐겁다 하나, 송산(松山 송도)이 안타까이 나를 기다리리.” 하였다.
○ 고려 김한룡(金漢龍)의 시에, “강산은 비 갠 뒤요, 운물(雲物)은 첫가을이로다. 속대(束帶 예복을 입음)하고 임금 모시고, 갈림길에서 국서(國書)를 올리네. 누에 오르니 문득 흥이 일어, 황홀하여 허공에 의지한 듯하구나. 중선(仲宣)의 부(賦)를 짓고자 하노니, 옆 사람이여, 나를 비웃지 말라.” 하였다.
○ 고려 우길생(禹吉生)의 시에, “임금 모시고 누에 오른 날, 처량한 비 처음 개었도다. 임금이 와서 표를 보내고, 도적(홍건적)은 항복하는 글을 보내왔네. 햇빛이 늦게 떠오르니 산은 그림 같고, 가을은 깊어 물은 허공 같도다. 이 남녘 고을이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나, 하염없이 바라보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하였다.
○ 이강(李岡)의 시에, “임금 모시고 남녘으로 순행(巡幸)하는 날, 누에 올라 처음 보는 풍경, 산천은 혼연(渾然)히 그림 같고, 풍경 또한 글로 표현키 어렵도다. 서리 내린 하늘은 고요하기만 하고, 안개 걷힌 들판은 훤하기만 하도다. 바로 알겠네. 천년 뒤에, 이 응제(應製) 반드시 나를 비웃으리.” 하였다.
○ 염흥방(廉興邦)의 시에, “이 누각 세운 지 그 얼마인고, 단청(丹靑)이 처음같이 빛나는구나. 늘어선 선장(仙杖 임금의 의장(儀仗))은 햇빛을 가리고, 낡은 현판에 새긴 글씨는 선명도 하구나. 가을이라 바야흐로 추수가 한창인데, 밝은 해는 허공을 넘으려 하는구나. 성사(盛事)를 참으로 기릴 만한데, 주고 받는 시가 나의 차례로구나.” 하였다.
○ 고려 전녹생(田祿生)의 시에, “임금께서 이 누에 올라 바라보시는 날, 만물을 기쁘게 보시는 처음이라. 이 아름다운 풍경을 누가 읊을 수 있으리요. 서투른 글은 차마 쓸 수가 없네. 임금님 얼굴 가깝기도 하거니, 북녘에 절하는 뜻은 헛되지 않겠지. 볼수록 산수는 빼어났고, 구름과 안개 또한 나를 반기네.” 하였다.
○ 고려 최용(崔龍)의 시에, “남녘으로 순행(巡幸)한 뒤, 누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기 처음이라. 난간에서 옥색(玉色)을 보고, 벽을 쓸어 먼지 낀 글을 찾아보노라. 먼 곳 멧부리는 갠 뒤라 더욱 뾰족하고, 모난 못은 허공처럼 맑네. 이 풍경 완상할 만하니, 시 짓고 읊조리는 데 어찌 빠지리오.” 하였다.
○ 고려 권주(權鑄)의 시에, “누각을 돌며 해와 달을 보니, 비로소 이름을 짓는 시초 알겠노라. 증손(增損 시문의 글자를 더하고 줄임)을 누가 교묘히 하리요, 형용하자니 글쓰기 스스로 부끄럽네. 고기를 보니 못에 푸른 물결 일으키고, 학을 타니 길 하늘로 치닫네. 일재(一齋)의 운에 화답하려 하니, 맑은 바람이 문득 나를 깨운다.” 하였다.
○ 고려 박중미(朴仲美)의 시에, “누각의 값어치 세 갑절로 늘었구나, 임금께서 처음으로 수레 멈추시네. 구름 안개 뭉게뭉게 일어나고, 풍경은 도서(圖書)에 들어오도다. 들이 넓으니 봉우리 눈썹같이 벌여 있고, 수풀이 성기니 눈앞이 탁 트이도다. 글짓는 신하들 다투어 읊어대는데, 쓸모없는 재목인[樗散] 내가 도리어 서글프구나.” 하였다.
○ 고려 김군정(金君鼎)의 시에, “남산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떠도니, 임금 행차 처음으로 이 누에 멈추었네. 성덕은 참으로 그리기 황공하고, 기이한 풍경은 특서(特書)하기 합당하도다. 가을 바람은 늙은 나무에 불고, 구름 그림자는 훤한 시내로 지나가도다. 훗날 다시 말고삐를 여기 돌리거든, 강산 또한 나를 알아보리.” 하였다.
○ 고려 화지원(華之元)의 시에, “이 누각 풍경이 좋으니, 임금님 황송스럽게 처음 거둥하였네. 남녘으로 순행하는 깃발 다시 갖추고, 북녘으로 올리는 글을 멀리 전하도다. 흐뭇한 이야기 온 동네에 파다하고, 화기(和氣)는 공중에까지 가득하도다. 운예망(雲霓望 가뭄에 구름이나 무지개를 바라보는 심정)을 기록함에 있어, 어찌 나만이 뒤지리오.” 하였다.
○ 고려 우현보(禹玄寶)의 시에, “이 누각에 몇 사람이나 올랐던고, 임금이 거둥하신 건 전에 없던 처음 일이네. 이미 시를 기(記)로 삼았으니, 어찌 꼭 역사에 적어야만 하리오. 깎인 언덕은 난간 앞에 트이고, 성긴 버들은 처마를 둘러 훤하도다. 가까이 모심도 내 분수에 넘지마는, 부축하여 오르는데 나를 허락하셨네.” 하였다.
○ 고려 이인(李靭)의 시에, “누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는 날, 대궐을 향하여 처음 글을 올렸도다. 임금님 분부로 신하들에게 시를 읊으라시니, 시를 이룸에 임금을 마주 뵙고 쓰는구나. 재 넘는 구름은 오락가락하고, 시내에 비친 달은 몇 번을 차고 또 기울었나. 현종(顯宗)이 여기에서 나라를 크게 회복하였으니, 땅 신령이 도리어 나를 위로하는구나.” 하였다.
○ 고려 한방(韓昉)의 시에, “누각이 서원(西原) 북쪽에서 절하노니, 단청이 처음같이 빛나는도다. 잠깐 새로 행차[警蹕]를 머무르시니, 다시 옛 거서(車書)를 보게 되도다. 나무는 늙어 천 그루[千章]나 되고, 처마는 높아 사방이 훤히 비라보인다. 글 제목을 나열하기 어려우니, 어려운 운자(韻字)에 나보다 못한 이는 없으리.” 하였다.
○ 고려 조계방(曹繼芳)의 시에, “이 누각이 늘 좋기도 하더니, 임금 수레를 처음으로 맞았구나. 이 경치 구경 누가 사양하리오마는, 시를 읊는 데는 오래토록 못하는구나. 저녁 볕은 먼 산길을 비추고, 흐르는 물은 맑은 공간을 끊었도다. 어부와 나뭇군에게 말을 건네니, 한가로운 무리는 그대들과 나뿐이리.” 하였다.
○ 고려 허전(許佺)의 시에, “임금 수레 서원(西原)에 머물고, 누에 올라 표문 올리기 처음이라. 오늘의 일을 쓰기 위하여, 지난날의 글을 다시 찾아보노라. 먼 곳 물은 하늘에 이어 맑고, 성긴 숲은 강 언덕을 따라 훤하도다. 성덕을 노래하는 다행한 인연이, 나에게까지 미칠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리.” 하였다.
○ 고려 전득량(田得良)의 시에, “임금 깃발이 남녘으로 순행한 뒤, 비녀와 치마를 다시 마련하기 처음이라. 전문(箋文)을 올림은 예의를 지킴이니, 성덕을 그리는 시를 지어 바치노라. 눈에 가득 기이한 풍경이 빼어났고, 머리를 돌리니 지난 일이 헛되기만 하구나. 재주 없는 몸이 외람되이 차운하려 하니, 여러 선배들이여, 나를 나무라지 말라.” 하였다.
○ 고려 이방직(李邦直)의 시에, “임금 타신 수레 순행하여 오는 날, 삼한(三韓)이 옛적으로 돌아가기 처음이라. 임금님 분부 있어 화답하는 시 짓노니, 곧 붓을 놀려 다투어 쓰는구나. 물을 굽어보니 거울인 듯하고, 난간에 의지하니 황홀하여 허공에 오른 듯하구나. 공 있는 신하가 10대를 지난 뒤면, 남은 경사[餘慶]는 나에게서 시작되리.” 하였다.
○ 한상질(韓相質)의 시에, “사신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조선(朝鮮)이 개국한 초기이라. 임금은 성지(聖旨)를 맞이하고, 부로(父老)들은 첨서(簽書 편지)를 하례하도다. 길에 떠들썩 풍악을 잡고, 깃발은 하늘을 덮었구나. 이런 것이 금의환향이라는 것, 그 영광 누가 나인 줄 알리.” 하였다.
[여지도서] 拱北樓(在州北三里縣監李裕身記樓創於勝國李葉而牧櫟諸公之作載於方與記迨今五百年之久滄桑刦火嬗變不常而樓之屈伸興廢隨焉李公暹之重修又在七十已往敗瓦殘礎今無存者徘徊咨嗟之餘略捐財力仍舊址而重建若干楹取牧櫟諸公作刻諸壁上以存古跡云爾其後牧使李秀得又重修 高麗白文寶應製詩序歲在辛丑宮駕遷自福而尙行駐淸州壬寅秋九月十九日上率群臣拜賀正表于郊國御州之拱北樓覽一齊權漢功舊題五言句卽命知申事元松壽代言李穡成士達次韻製進於是左政承洪陽坡李杏村黃檜山暨諸大夫儒生皆和進文寶時適承命如京歆聞引頸自以不獲覩盛事爲恨及是承召竊嘗追和續尾亦以爲幸而州伯金君成甲以柳思庵之言屬之曰命製詩成而將鏤板不可無序文寶辭以無文而幸其傳不朽遂操筆而拜稽首曰昔者君臣賡歌固是昇平製作而去年奔亂以還豈謂有今日勝事於戲吾王事天敬命之誠與名拱北而可表者不在斯樓歟其詩曰拱北名雖舊吾王敬命初氛埃今已掃雲物正當書宸極瞻依遠川原向背虛斯民知所感責在一人予 權漢功詩拱北樓新搆庚申十月初詩從權贊善功自尹尙書古道依紅樹淸池倒碧虛留連日將暮山色正愁予 辛藏詩井邑山川好居民尙大初坐賓前內翰牧伯舊中書松櫟千峯秀桑麻四野虛倚欄吟未已林鳥苦摧予 元松壽詩絶景登樓處淸辰應製初喜承今日寵慙繼古人書路豁南來直山遙北晀虛醴泉行樂好榮幸莫如予 李穡詩鑾輿淸曉動文物太平初樓逈膽天近詩成奉勅書山光生悅懌秋氣集沖虛他日南巡紀含香亦有予 成士達時歲籌將盡際天氣稍寒初扈輦登華構濡亳和舊書秋深蓮萼謝風勁樹陰虛軒蓋榮光裏躊躇尙媿予 洪彦博詩鳳輦東還日金風木落初江山留我住詩句借人書路直朝南遠樓高拱北虛老來常侍從壁上莫忘予 李巖詩古郡高樓逈誰知結構初秋深萬山樹景入數行書遠岫供西望靑雲補北虛登臨參侍從光寵自慙予 李齊賢詩省方南國日拜表北樓初浩蕩尊前興縱橫筆下書風高雁遵渚雲淨鶴沖虛老矣今多病懽恩負倡予 黃石奇詩郡樓雖曰好駐駕也應初無限池中景何能壁上書登臨喜廣蕩俯仰實淸虛多謝醴泉相留詩使起予 柳淑詩北樓陪賞日東國中興初勝事將傳示新詩强自書旌旄森滿路袞黻逈臨虛此地雖云樂松山苦徯予 金漢龍詩江山新霽後雲物九秋初束帶陪天仗分街拜國書登臨聊發興怳惚若憑虛欲繼仲宣賦傍人莫笑予 禹吉生詩扈從登樓日凄凉雨霽初君王來送表冠賊聘降書景晏山如畫秋深水似虛南州雖信美悵望轉傷予 李崗詩扈從南巡日登樓縱自初山川渾似畫景物亦堪書霜落長天靜烟消大野虛端知千載下應製必嗤予 廉興邦詩起樓知幾日金碧炯如初掩暎森仙伏林漓古板書淸秋方省斂白日欲凌虛盛事眞堪頌賡詩況屬予 田祿生詩一人登眺日萬物喜瞻初美景誰能賦荒詞不用書面南顔甚邇拱北意無虛寓目山河秀雲烟亦嬪予崔龍詩遊豫南巡後登臨四望初當軒瞻玉色掃壁撿塵書遠岫晴相簇方池澹若虛物華雖可賞題詠豈□予 權鑄詩繞樓曕日月始覺立名初增損誰能巧形容自愧書觀魚池㶑綠乘鶴路玄虛欲和一齋韻淸風忽惶予 朴仲美詩樓價增三倍吾王止輦初雲烟繞態度風景入圖書野廣眉峯列林疏眼界虛詞臣爭嘯詠樗散却嗟予 金君鼎詩南山浮瑞氣淸蹕駐樓初聖德其堪頌奇觀合特書秋風吹老樹雲影渡溪虛他日重回轡江山亦識予 華之元詩一樓風景勝千乘儼臨初更慗南巡斾遙傳北上書美談騰里巷和氣滿空虛記取雲冤望奚㶑爲獨後予 禹玄寶詩此樓幾登陟臨幸古無初已用詩爲記何須史亦書斷城當檻豁疏柳遶簷虛近侍參非分躋攀且許予 李韌詩登樓閱景日向闕拜箋初勅下令臣賦詩成對御書嶺雲租往返溪月幾盁虛顯廟此恢復地靈還慰予 韓昉詩樓拱西原北丹靑炳若初暫停新警蹕復見舊車書樹老千章古簷高四望虛品題難繼列險韻莫過予 曹係芳詩玆樓常亦好況値輦回初閱景誰能讓哦詩久未書斜陽明遠嶠流水割淸虛說向漁樵子閑曹儂與子 許銓詩駐輦西原後登樓拜表初爲題今日事更閱去年書遠水連天靜疏林傍岸虛豈圖歌聖德緣幸及於予 田得良詩旌斾南巡後簪裳再造初拜箋遵禮義頌德獻詩書滿目奇觀秀回頭往來虛不才叨繼韻群彦莫嗔予 李邦直詩大駕巡臨日三韓復古初和詩因有勅操筆立爭書俯水堪爲鑑憑欄況若虛功臣十世後餘慶自于予 韓尙質詩奉使還鄕日朝鮮開國初君王迎聖旨父老賀簽書鍾鼓喧周道旌旗蔽太虛由來稱畫錦榮幸孰知予)
| 키워드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