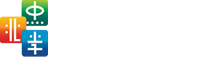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경영루(慶迎樓) |
|---|---|
| 분류 | 신증동국여지승람 |
| 시대/생몰년 | |
| 형태 | |
| 언어 | |
| 지역 | 충주 |
| 자료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
객관(客館) 동쪽에 있는데, 예전 이름은 동루(東樓)이다.
○ 정인지(鄭麟趾)의 기에, “충주는 남방의 요충지를 질러 막은 곳에 자리잡았다. 지역이 넓고 호구가 많으며, 이 때문에 공문서가 구름처럼 쌓이고 빈객이 모여들어서,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움이 남보다 뛰어난 인재가 아니면 그 번잡한 것을 다스릴 수 없다. 사군(使君) 김중성(金仲誠)은 공신(功臣)의 후사(後嗣)로서 사무 처리의 재간이 능하여 사대부(士大夫)들의 추앙하는 바이다. 여기에 목사로 나온 지 3년 만에 정사가 이루어지고 백성이 화목해졌으며 온갖 폐지되었던 것이 모두 새로워졌다. 그를 보좌하여 다스린 사람은 황영(黃永)이다. 정통(正統) 임술년(1442) 가을에 지금 임금께서 대신을 보내 우리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을 경주(慶州)에서 받들어 맞이하는데 길이 충주를 지나게 되었다. 사군(使君)이 고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조복(朝服)을 갖추고 고을 경계에 나가 맞이하였는데, 정청(正廳)이 낮고 누추하므로 객관 동쪽 누각에 모시고 엄숙하고 공손하게 우러러보며 향(香)을 올리고 네 번 절하고 물러났다. 이튿날 교외에서 공경히 전송하고 돌아와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어용(御容)이 잠깐 멈추신 것은 참으로 이 고을의 만나기 어려운 영광이니, 신자(臣子)로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받들어야 한다. 이 고을이 세워진 지 가장 오래되어 삼한(三韓)이 반드시 다투는 땅이 되었고, 신라에 있어서는 한강군(漢江郡)이 되었고, 고구려에 있어서는 국원성(國原城)이 되었는데, 예전 누각이 좁고 기울어져 관부(官府)에서도 쉴 곳이 없다. 하물며 어용(御容)이 돌아오시는 날에 다시 여기에 모신다면 신자의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불안하다.’ 하자, ‘그렇다면 어째서 새롭게 하기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감사 이익박(李益朴) 공과 도사(都事)와 강이(姜履) 군에게 아뢰었다. 이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재목을 베고 기와를 구어 산의 중 신정(信靖)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고을 사람 민수(閔修)가 그 역사를 감독하여 한 달만에 공사가 끝나매, 이름하기를 경영루(慶迎樓)라 하였으니, 대개 어용을 받들어 맞은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예성(蘂城)은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이름난 땅, 앞에 다가서는 산 빛이 자리 구석에 들어온다. 바람과 달은 공부(工部 두보(杜甫))의 읊음이 얼마나 많았던가. 시내와 산 모두가 망천(輞川)의 그림일세. 사람을 침범하는 서늘한 기운 은하수가 가까운 듯, 땅에 깔린 푸른 그늘 들새가 운다. 날이 다하도록 올라가 노는 무한한 뜻은, 석양이 점점 푸른 들로 내려오네.” 하였다.
『신증』 김종직의 시에, “진한(辰韓) 천 년의 국원(國原) 땅, 다시 층층 누각이 있어 동북 모퉁이를 눌렀다. 길은 옥구(玉鉤)로 나서 경계를 지었고, 땅은 금잔(金盞)을 나누어 그림을 이루었네. 웅풍(雄風)이 또 옷깃을 헤치고 받을 만하구나. 취한 글씨는 이마를 드러내고 부르짖는 것이 해롭지 않다. 서북으로 바라보니 어느 곳이 서울인가. 외로운 돛대 아득하게 푸른 들판에 닿았네.” 하였다.
○ 성현(成俔)의 시에, “땅이 감추고 하늘이 아끼는 별다른 땅, 대울타리 초가집이 성 모퉁이를 눌렀다. 사방 산의 경치는 멀리 보는 눈에 아득하고, 만 리의 곤붕(鵾鵬)은 장한 계획을 펴리. 버드나무 늘어선 큰 거리에는 버들개지 날아 어지럽고, 줄과 부들 낭떠러지 언덕에는 저녁 새가 부른다. 동풍은 봄빛이 늙는 것을 아끼지 않고, 쇠잔한 붉은꽃을 불어 흩어 푸른 들판 속에 점점하네.” 하였다.
○ “사방 들판의 외밭이 토란밭에 닿았는데, 물은 맑고 모래는 희어 물고기가 환히 보이네. 낭간 대[琅玕竹]는 바람 앞에 잎을 나부끼고, 수놓은 비단같은 산은 비온 뒤에 그림을 펼쳤도다. 백 묘(畝)의 벼꽃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고, 만 가구의 등불은 취하여 환호한다. 태평하여 조세를 재촉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 짖는 개는 긴 털이 나고 길에는 풀이 가득하네.” 하였다.
○ “구슬 꽃[雲]이 번쩍번쩍 온 지경에 일렁거리니, 백옥(白玉) 봉우리가 자리 모퉁이에서 솟아오르네. 나무에 가득한 찬 매화는 새로 꽃송이를 터뜨리고, 뜰을 침노하는 밝은 달은 그림을 이룬다. 천 개 항아리에 넘쳐 가득한 술을 탐스럽게 보고, 만 개 구멍이 휘몰아쳐 부르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르는 곳마다 임금의 은혜 깊기가 바다 같으니, 삼경(三逕)이 날마다 거칠어진들 혐의할 수 있으랴.” 하였다.
○ 양희지(楊熙止)의 시에, “명리(名利) 길 10년에 구구한 포부, 중원(中原) 땅 한 모퉁이에 목사로 왔네. 관사(官舍) 버들은 푸른데 도령(陶令)의 집에 연했고, 촌락 꽃은 붉어서 망천(輞川) 그림에 들어온다. 진흙이 골목 어귀에 깊었으니 제비가 다투어 모이고, 해가 나루 머리에 저무니 사람들이 어지럽게 부른다. 벼슬 버리고 돌아갈 계책은 이루지 못하고 몸은 또 늙었는데, 고향 동산의 솔과 국화는 이미 거칠어졌으리.” 하였다.
○ 홍귀달(洪貴達)의 시에, “수려한 물 아름다운 산이 명승(名勝)의 땅 만들어, 만가(萬家)의 밥 짓는 연기 성 모퉁이를 덮었도다. 마루와 창은 사람이 신선의 집에 누워 있는 듯, 바람과 비는 하늘이 수묵화를 이루었다. 꽃 속에서 회포를 읊으니 봄새가 화답하고, 술 옆에서 잠이 드니 미인이 부른다. 번화한 신세가 도리어 우습구나. 시골 전원이 반은 거친 것을 어이하리.” 하였다.
| 키워드 | 신증동국여지승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