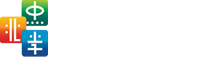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 명칭 | 가학루(駕鶴樓) |
|---|---|
| 분류 | 충북의 누정,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산수유기 |
| 시대/생몰년 | 1403년 |
| 형태 | 팔작지붕 집 |
| 언어 | |
| 지역 | 영동 |
| 자료출처 | 충북의 누정,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산수유기 |
황간향교 앞에 있는 누정이다. 조선 태종 3년(1403)에 현감 하담(河澹)이 처음 세웠다. 경상도 관찰 사 남재(南在)가 "마치 학이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듯하다" 하여 편액하여 "가학루"라 하였으며, 이첨이 기문을 썼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광해군 때 현감 손번이 다시 세웠다. 숙종 42년 (1716)에 현감 황도가, 정조 5년(1781)에 현감 이운영이, 1930년에 군수 전석영이 각각 중수하였다. 6, 25전란 후에는 황간초등학교가 불타자 한때 학교 건물로도 사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
○ 객관(客館) 남쪽에 있다. 불에 탔는데, 성화(成化) 병오년에 현감(縣監) 손번(孫蕃)이 중건(重建)했다.
○ 이첨(李詹)의 기(記)에, “의성 남공(宜城南公)이 석덕(碩德) 원훈(元勳)으로서 경상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을 때, 마침 하동(河東) 하담군(河澹君)이 이웃 군(郡)에서 정무를 매우 잘하여 황간(黃澗)으로 옮겨와 일을 맡았는데 한달 남짓 만에, 공(公)이 순시(巡視)하러 와 보니 과연 정사가 간략하고 평이하여 백성들을 부릴 만했다. 이에 하군(河君)에게 이르기를, ‘황간(黃澗)은 산골 고을로서 동서로 가는 사신들이 수십 리를 가야만 위험한 곳을 벗어나게 된다. 이제 이미 큰 언덕에 의지하여 성을 쌓았는데, 성이 큰 시내를 끼고 해자로 백성들과 한계를 지었으니, 그런대로 사람들을 잘 모았다. 그러나 제도(制度)를 바야흐로 새롭게 하는 터에 공관(公館)이 낮고 비좁은데 왜 증축(增築)해서 올라가 노닐 만한 곳을 만들어 답답한 마음을 통하게 하고, 맑고 시원한 것을 맞아들여 마음을 비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지 않는가.’ 하였다. 하군(河君)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고을의 다행입니다.’ 하고, 곧 노는 사람들을 써서 가까운 산에 가서 재목을 취하고 농사 짓는 들에 가서 기와를 구워 운반하는데 수고롭지 않게 하여, 계미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듬해 정월에 완성했는데, 낭무(廊廡)와 당실(堂室)이 모두 크고 아름다워, 그 누(樓)를 보니 우뚝하였다. 공(公)이 두 번째 순시하러 왔다가 여기 올라가 보니 큰 산, 긴 골짜기의 구름과 달, 거친 터와 들, 물 위에 바람과 연기, 물고기가 냇물에 헤엄치며 흐르고, 새가 구름에 나는 조화(造化)의 묘한 것이 눈에 접하여 정신에 융회(融會)되고 충만하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공(公)은 이에 현판을 써서 가학(駕鶴)이라 했으니, 이는 대개 천지의 시초를 초월하고 도(道)의 본체에 혼합되며 바람을 타고 날개 돋힌 신선이 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히 공(公)의 우언(寓言)일 뿐이로다.” 하였다.
○ 이원(李原)의 시(詩)에, “집이 공중에 높이 솟았으니, 여기 올라와 종일토록 머무네. 경옥(瓊玉)과 같은 봉우리는 난간에 닿아 빼어났고, 금 같은 시냇물은 마을을 안고 흐르네. 길은 긴 숲 밖으로 나갔고, 성은 큰 들판 머리에 임해 있네. 이것은 아마도 선경(仙境) 속에서 학을 타고 바람 따라 노님인가 의심하네.” 하였다.
○ 유사근(柳士根)의 시(詩)에, “학의 등은 참다운 선경(仙境)인데, 항아리 속[壺中]에 세월은 머루르네. 도끼자루는 바둑판 때문에 썩었고, 도원(桃源)의 꽃은 동구(洞口)로 흘러 나가네. 나는 새 긴 하늘 가에 사라지고, 구름은 옛 성 머리에 차갑도다. 적막한 천년 뒤에 많이들 와서 계속 노리로다.” 하였다.
『신증』 조위(曺偉)의 〈중수기(重修記)〉에, “황간(黃澗) 고을은 층층한 산마루를 의지하고, 절벽(絶壁)을 굽어 보고 있다. 동남의 모든 구렁의 물들이 그 아래로 돌아 꺾이어 서쪽으로 가는데, 세차게 흘러 돌에 부딪치면 거문고와 비파, 피리 같은 소리가 주야로 끊어지지 않는다. 고을 서쪽 5리쯤 되는 곳에 두어 봉우리가 우뚝 솟아 섰는데 가운데 청학굴(靑鶴窟)이 있다. 바위골이 그윽하고 깊으며 연기와 안개가 아득하여, 지나는 사람은 인간 세상의 경계가 아니라고 의심한다. 객관(客館) 모퉁이에 성가퀴(성 위에 나지막하게 쌓은 담)가 있어 푸른 언덕에 임해 있는데, 옛적에 여기에 누(樓)가 있었으니 이것이 가학루(駕鶴樓)이다. 영락(永樂) 연간에 귀암(龜巖) 상공 남재(南在)가 현판을 단 것이다. 그 뒤에 불에 타서 객관과 함께 모두 재가 되고 말았고, 다만 주춧돌만 남아 있은지 40여 년이 되었다.
성화(成化) 병오년에 밀양(密陽) 손번(孫蕃)이 청아(淸雅)하고 통달한 재주로써 교서관(校書館)에 뽑혀 들어갔다가 어버이가 늙으므로 수령으로 나가기를 청해서 이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부임하자마자 기강(紀綱)이 새로워지고 해가 넘지 않아서 지경 안이 크게 다스려졌다. 이에 아전과 백성들과 의논하여 공인과 역군[工徒]들을 모아서 객관을 중수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여 기유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듬해 7월에 완성했다. 먼저 정청(正廳)을 세우고 다음으로 익실(翼室)을 지었으며, 익실 동남쪽에는 옛터대로 누(樓) 세 칸을 일으키고 인하여 가학(駕鶴)이라고 현판을 달았다. 비록 이것은 기왓장과 들보가 서로 이어서 따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바라다보면 날라가는 듯하다. 난간과 문 가운데 강산을 맞아들이고 책상과 자리 위에 항해(沆瀣)를 일으키는 듯해서 허공에 매달린 듯한 뛰어난 경치가 실로 이 한 도내에서 제일이다. 여기 오르는 자는 표연(飄然)히 낭원(閬苑 선녀 서왕모(西王母)의 동산) 단구(丹丘 신선 사는 곳)를 밟는 듯하다. 현감 손번이 누(樓)의 경치를 글로 적어서 나에게 기문을 청했다.
내 생각건대 경치가 스스로 명승(名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명승이 되는 것이니, 폐하고 흥하는 데 경치와 사람이 만나고 합하는 운수가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우주(宇宙)에 이 강산이 생긴 이후로 반드시 안목을 갖춘 자를 기다려야만 그것을 발휘하고 이름을 드러내 문자에 실려 무궁하게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것이니, 황강(黃岡)이 소동파(蘇東坡)를 만나지 못했으면 적벽(赤壁)이란 이름이 어찌 나타났을 것이며, 무이(武夷)가 주회암(朱晦菴 주자(朱子)의 호)을 만나지 못했으면 운곡(雲谷)이란 이름이 어찌 알려졌으리요. 그러나 소동파의 필력(筆力)과 주회암의 도학(道學)도 반드시 적벽과 무이의 도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경치와 사람이 서로 만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유익함이 어떠한가. 이제 황간(黃澗)의 계산(溪山)과 운물(雲物)은 처음에는 귀암(龜巖)을 만났고, 두 번째는 현감 손번을 만나서 하늘도 숨기지 못하고 땅도 감추지 못해서, 그 맑은 경치를 더욱 더하게 하고 그 정채(精彩)를 발하게 되었으니, 어찌 천고(千古)에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현감 손번이 정사를 보는 여가에 여기 올라가 바라보면 청산(靑山)은 스스로 푸르고 백운(白雲)은 스스로 희어 마음 가운데 조그만 티끌도 일어나지 않아서, 소연히 세상 근심의 시끄러운 것을 잊고, 유연(悠然)히 도체(道體)의 유행함을 보아서 학문이 날마다 고명광대(高明廣大)한 지경에 나아갈 것이, 어찌 한갓 그 문장을 크게 드날리고 그 생각하는 것을 도울 뿐이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황간의 다행함이겠는가. 또는 현감 손번의 다행함이겠는가. 나는 티끌 속에 파묻혔으면서 남쪽 나라의 강산(江山)을 마음속에는 그리워한지 오래이다. 훗날 무슨 일이 있어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곳에 가서 노닐며 누각에 올라 한 번 취해서 임고도사(臨皐道士)의 꿈을 다시 잇고, 구령자진(緱嶺子晉)의 옷소매를 잡아 당기며 최호(崔灝)ㆍ이태백(李太白)의 시를 읊고 가학(駕鶴)의 뜻을 자세히 토로하여 평소의 소원을 풀어볼까 하노라.” 하였다.
○ 서거정(徐居正)의 시(詩)에, “황주(黃州)는 참으로 맑으니, 가서 머물고 싶네. 학은 날아 갔어도 누각은 그대로 있고, 산은 높고 물은 절로 흐르네. 나는 새의 등을 굽어보고, 바로 큰 자라 머리에 올랐네. 한없는 등림(登臨)의 흥(興)은, 긴 노래로 멀리 원유편(遠遊篇)을 부르네.” 하였다.
○ 이숙함(李淑瑊)의 시(詩)에, “젊었을 때 방랑(放浪)해서 이 땅에 놀았더니, 탄환같이 빠른 세월 몇 가을 지났는가. 옛 누각은 부서졌는데[槌碎] 이제 새로 지었으니, 공이 많은 사군(使君)은 옛 제후(諸侯)로다.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요란스레 튀고, 멀리 어두운 그늘진 계곡엔 신령스러운 바람 메아리치네. 단청한 난간에 의지해 주렴(珠簾) 걷고 있노라면, 삼라만상의 온갖 경치 눈앞에 달려오네. 앉아서 초경(初更) 달 기다리니, 달 그림자 흔들흔들[婆娑] 다시 곱고 예쁘네. 손으로 희롱하면 그 맑은 것 움켜쥘 듯, 발로 은다리[銀橋] 밟는 것 어찌 족히 말하리. 우주(宇宙)에 올려다 보고 내려다 보아 샅샅이 찾아도, 최호(崔灝)는 가버리고 붙들 수 없네. 서리가 방초(芳草)를 말려 죽여 다시 처처(萋萋 무성한 모양)하지 못하니, 다만 역력히 개인 시내만 흐르네. 피리는 어느 곳에서 불어 허공에 사무치는가. 나그네의 시름 불러 일으켜 구름이 멀고 머네. 벽에 쓴 글귀 다시 나를 흥기시켜, 높은 곡조 화답하려고 머리가 학처럼 기웃하네.” 하였다.
○ “땅은 옛이건만 구름은 아직 있고, 누(樓)는 비었는데 학은 머물지 않네. 여기 올라 큰 탄식 발하고, 배회하며 긴 강물 굽어보네. 산이 머니 천목산(天目山)인가 의심스럽고, 성이 높으니 바로 석두(石頭)로세. 눈은 창가에 대[竹]소리 나니, 나그네의 맑은 놀음 도와주는 듯.” 하였다.
○ 최숙생(崔淑生)의 시(詩)에, “누런 학은 가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은 지금도 오히려 머물러 있네. 올라보니 푸른 하늘에 이어 있고, 휘파람 불고 읊는 이 몇 청류(淸流)인고. 시내는 꺾여 저절로 다리[股] 나뉘었고, 산은 비껴 다투어 머리를 들었네. 은근히 글 한 구 적으니, 다음날 이 노닒을 생각하리.” 하였다. ○ “땅은 이 누(樓)의 경치 만들어 냈고, 하늘은 우리를 머물게 하였네. 산은 아침저녁으로 자태가 다르고, 물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흐르네. 나는 새도 때때로 등을 보겠고, 긴 대나무는 다만 머리만 보이네. 뜰이 한가로워 공사(公事) 적으니, 배회하며 봄놀이하는 격일세.” 하였다.
[여지도서] 영동현, 누정
가학루(駕䳽樓)
12칸이다. 현의 남쪽 3리, 옛 관아터에 있다. 산꼭대기에서 탁 트인 벌판을 굽어보고 있으며 아래로는 장천(長川)을 거느리고 있는데, 안개 노을이 아득하고 어렴풋하니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 조선 초에 현감 하담이 처음 지었으며, 재상 남재가 현판을 달고 이첨이 기를 지었다. 두 차례나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 수령 손번과 구장원이 앞뒤로 고쳐 지었다.(駕䳽樓 十二間在縣南三里舊官基 本頭俯臨時下統長川烟霞縹緲若在半空○本朝初縣監河澹始建南相公在揭扁李詹記之再爲煨燼地主孫蕃具長源前後重修)
| 키워드 | 충북의 누정,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산수유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