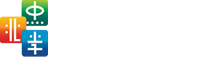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四郡山水可遊記 |
|---|---|
| 분류 | 산수유기 |
| 시대/생몰년 | 1823년(순조23) 4월 12일~5월 13일 사군 유람: 4월 24일~5월 2일 |
| 형태 | 괘인사본(罫印寫本) |
| 언어 | 한문 |
| 지역 | 서울-광주-이천-음 |
| 자료출처 | 冠巖全書 제22책 |
저자는 평소 자신의 시문을 시기별로 엮어두었으며, 2차에 걸쳐 이를 다시 종합하였다. 우선 1837년 당시까지 지은 시문을 종합하여 「耘石外史」를 편찬하였다. 「운석외사」는 저자가 15세 되던 1788년부터 1809년 출사하기까지의 시문을 엮은 前編, 1810년 출사한 이후부터 60세 되는 1833년까지의 시문을 엮은 後編, 그리고 1833년부터 70세 이전의 시문을 엮은 續編의 전체 3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뒤 저자는 70세 무렵, 「운석외사」 3편과 그 이후의 저술을 종합하여 20部 110卷으로 改編하여 이를 ‘叢史’라 명명하고, 손자 洪祐命과 洪祐慶에게 교감하도록 하였다. 저자는 이렇게 저술을 정리한 의도와 경위를 자세한 기록으로 남겼는데, 현전하는 저자의 저술은 저자의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전하는 저자의 저술은 15종 190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大東掌故」, 「冠巖紀年」, 「重訂南漢志」, 「國朝樂歌」, 「耆社志」의 5종은 別著이며, 「운석외사」,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續編」, 「叢史」, 「冠巖遊史」, 「耘石文選」, 「始有集」, 「冠巖存藁」, 「秋史」, 「冠巖全書」의 10종은 문집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운석외사」, 「관암산방신편운석외사」, 「관암산방신편운석외사속편」은 저자가 자편한 「운석외사」의 전편, 후편, 속편에 해당한다. 「叢史」는 「운석외사」 3편 이후의 1837~1850년 사이 시문을 모은 것으로, 저자가 70세에 개편한 「총사」와는 구성이 상이하다. 어쨌든 「운석외사」 3편과 「총사」를 합하면, 저자의 시문은 시기별로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관암유사」, 「운석문선」, 「시유집」, 「관암존고」, 「추사」 등은 選集에 해당한다. 「관암유사」는 연행에서 중국 문인에게 보이기 위해 엮은 것이며, 「운석문선」 역시 같은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유집」은 20세부터 70세 사이의 저작을 두루 엮은 것이며, 「관암존고」는 遊記, 「추사」는 詩를 따로 엮은 것이다. 대부분의 시문은 「운석외사」 3편 및 「총사」와 중복되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문도 더러 보인다.
「관암전서」(古3428-263(1))는 전 생애에 걸쳐 지은 시문 중 상당수를 가려뽑은 것으로, 시기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며, 문체별, 시기별로 정리되어 10종의 문집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다. 저자가 자신의 시문을 종합하려는 의도에서 자편한 것으로 보인다. 「관암전서」의 체재는 저자가 개편한 「총사」와도 상이하고, 저자의 저술 내에는 편찬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찬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말년의 저작은 극히 일부만 포함된 점으로 미루어 저자 70세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시문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서 2010~2015년에 「관암전서」, 「총사」, 「관암산방신편운석외사속편」을 영인 간행한 바 있다.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