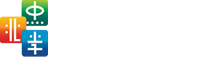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遊永春記 |
|---|---|
| 분류 | 산수유기 |
| 시대/생몰년 | 1772년(영조48) 4월 15일 |
| 형태 | 활자본(聚珍字) |
| 언어 | 한문 |
| 지역 | 영춘 |
| 자료출처 | 保晚齋集 권8 |
저자는 少論 출신으로서 利用厚生을 추구하는 北學派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찍부터 博學으로 이름나 정조 연간 奎章閣 운영의 기틀을 잡고 각종 편찬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아들 徐浩修, 손자 徐有榘에게 家學으로 이어졌다. 본집의 題名인 ‘保晚齋’란 호는 1781년 하사받은 것인데, 정조는 저자가 제학으로 있으면서 鄭厚謙과 洪國榮의 위협을 물리친 것, 동생 徐命善이 상소하여 종사를 보위한 것 등을 저자의 세 가지 晚節로 삼아 만년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내려주었다. 이러한 正祖의 배려 덕분에 저자는 洪啓能과의 연계설로 끊임없이 공척을 받으면서도 보존할 수 있었으며, 天文, 易學, 音樂, 農政, 韻學, 歷史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는 致仕 이후에 많은 서적 편찬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저술을 세심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저자의 저술은 類書의 일종인 「保晚齋叢書」 60권, 詩文과 別著를 포함한 「保晚齋四集」 55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剩簡零編 수십 권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이 剩簡 중의 일부가 「易先天學」, 「仁書」, 「詩史八箋」 등인 듯하다. 「四集」을 內編으로, 「叢書」를 外編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내편과 외편은 각각 다시 4부로 나누어진다. 「四集」은 前後左右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자의 致仕 전인 1780년까지의 詩文이 실린 前集과 그 이후의 시문이 실린 後集, 그리고 鍾律全書, 韻瑞三秤 등 음악과 운학을 다룬 右集과 風簷考, 陽谷志, 月令義, 啓蒙通, 爐熏筆, 竹林話 등이 실린 左集이다. 「총서」는 先天四演, 尙書逸旨, 詩樂妙契, 大學直指, 中庸經緯 등 5편으로 이루어진 經翼 8권과 疇史, 緯史, 本史 3편의 史別 28권, 髀禮準, 先句齊, 元音鑰, 參同攷 4편이 실린 子餘 12권, 攷事十二集의 集類 12권 총 60권으로 전통적인 經史子集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孫 徐有榘가 지은 遺事와 祭文에 의하면, 저자는 평소 저술을 매우 좋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붓을 놓지 않아 평안 감사에서 돌아올 때에 싣고 온 서적의 반이 저술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저자는 「총서」의 집필에 전력을 기울인 듯하다. 1784년 「보만재총서」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서유구에게 史別 중 緯史 부분을 보충하도록 義例를 정해 주었다가 나중에 손수 완성하였으며, 1785년 이후 蓉洲에 은거하면서부터 「叢書」의 마무리에 전념하여 사람을 시켜 繕寫하게 하고 직접 교감을 마쳐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徐有榘에게 훗날 간행할 수고가 더 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자는 평안 감사 시절 직접 丁酉字를 주조하는 등 출판에도 관심이 많았으므로 자신의 「총서」가 후손에 의해 간행되기를 바랐던 듯하다. 이 「총서」 60권은, 1786년 정조가 승지로 재직하던 아들 徐瀅修를 통해 구해본 뒤 우리나라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巨編이라고 극찬하였다. 그 후 1787년 저자가 직접 序와 凡例를 짓고 ‘保晚齋叢書十三種’이라고 제명하였다. 그러나 「총서」는 간행되지 못한 채 罫印淨寫本으로 전해져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貴235)과 규장각(古0270-11)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徐瀅修, 徐浩修가 교정을 보고 徐有本, 徐有榘가 교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총서의 대부분이 저자의 手校를 거쳤으나 마지막에 정리된 史別의 緯史 일부는 미처 마치지 못하여 자손들에 의해 완성된 듯하다.
문집의 경우 1782년에 正祖가 저자의 草稿를 구하여 보고 시를 지어 내렸는데, 이에 대해 李福源이 序를 지어 歐陽修, 賀知章의 故事에 비하며 영광스럽게 여겼고 저자도 箋을 올려 사례한 뒤 閣을 지어 御詩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때 정조가 乙覽한 초고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때의 徵稿가 詩文에 그쳤다고 한 것으로 보아 詩와 「周易」과 관계된 글 일부만 抄選하여 올렸던 듯하다. 저자의 사후 정조는 奎章閣 外閣에 명을 내려 저자도 賓客을 지낸 文衡이니 黃景源의 예에 따라 內帑庫의 物力으로 문집을 간행해 주라고 명하였다.(정조실록 11년 12월 20일)
아들 徐瀅修가 쓴 保晚齋四集編例題辭에 의하면, 자신과 徐浩修, 조카 徐有榘가 함께 講定하여 편차하였는데 四集으로 나눈 것은 「周易」 四象에 근본한 것이고 총수가 55권인 것은 河圖의 숫자를 취한 것이며, 前後左右集의 순서도 卦圖에 근본을 둔 것으로 「叢書」의 규모를 모방하여 역시 저자가 연구해 온 先天學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편집의 취지를 삼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들 서형수와 서호수, 손자 서유구가 주축이 되어 저자의 「四集」을 정리하는 한편, 전집과 후집 중 古今體詩 2권과 疏箚, 序記, 碑誌, 雜文 14권을 산정하여 1787년 16권 8책으로 편찬하였다.(丁未年編定本) 그러나 이때 본집은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838년 서유구가 정미년편정본 16권 8책을 활자로 인행하였다.《초간본》 현재 규장각(古3428-510, 奎4376, 4377, 5440), 장서각(4-606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76, 古3648-文33-20),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65)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서유구의 발문에 의하면, 정미년본을 편정하고 對校와 교정까지 한 뒤 간행을 기다렸으나 時事가 변하고 家禍가 잇따라 편정본은 상자 속에 보관된 채 40년이 흘렀다고 한다. 사실 저자의 집안은 정조 시대에는 少論 時派로서 학계와 관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純祖의 즉위 이후 辟派의 공격을 받아 서형수는 오랜 유배 생활 끝에 1824년 유배지에서 죽고, 서유구도 1827년 이후에야 관로에 나올 수 있었다. 간행시 正祖의 詩와 李福源의 序를 卷首에 넣고 본집의 간행 경위와 저자의 저술 규모를 적은 자신의 跋과 識를 부기하였다. 여기서는 「保晚齋四集」 의 권수가 총 64권으로 되어 있어 앞에서 徐瀅修가 언급한 55권과 권수가 약간 다르다. 이는 서유구가 본집을 간행하면서 「四集」과 「叢書」, 剩簡 등 나머지는 권수가 너무 방대하여 한꺼번에 간행하지 못하므로 繕寫해 두어 후일을 기약한다고 한 것을 보아 본래 55권으로 편정했던 「四集」의 규모를 剩簡 등 다른 저술을 더 보태어 64권으로 다시 편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보만재사집」의 전집은 찾을 수 없어 구체적인 구성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서유구의 발문에서는 본집을 聚珍字로 인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취진자는 대체로 1815년경 南公轍이 제작한 활자로 印本으로는 남공철의 「金陵集」, 「歸恩堂集」 등이 있으며 「保晚齋集」이 마지막 인본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의 집안은 대대로 서적의 편찬과 인행에 많은 관심이 있어 저자가 평안 감사 시절 丁酉字를 주조하였고, 서유구도 집안에 수만 자의 활자를 보유하여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에 「種藷譜」와 「桂苑筆耕」 등을 인행하였다고 하였는데(與淵泉洪尙書論桂苑筆耕書, 徐有榘 撰, 風石集 卷3), 정작 집안의 문집은 간행하지 못한 채 저자의 「叢書」나 서형수의 「明皐全集」, 서유구의 「風石集」 등도 稿本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의문이다.
본서의 저본은 1838년 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46-가76)이다.
| 키워드 | 영춘, 사군산수, 徐命膺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