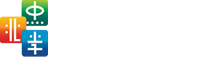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南窟石壁記 |
|---|---|
| 분류 | 산수유기 |
| 시대/생몰년 | 1740년(영조16) |
| 형태 | 활자본(韓構字) |
| 언어 | 한문 |
| 지역 | 영춘 |
| 자료출처 | 雷淵集 권14 |
저자는 李縡의 문인으로서 正祖의 元孫 시절 師傅로 발탁되어 輔導하는 공을 세웠으므로 死後 정조가 芸閣에 명하여 문집을 간행해 주도록 하였다.
저자는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自編해 놓고, 동생 南有定과 張道純 등에게 寫出하도록 하였다. 당초 저자 중년 이후 성장한 자손이 없어 저술과 시문이 수습되지 못하자 동생 南有定(1722~1775)과 조카 南公弼(1715~1763)이 시문을 校正, 繕寫하여 自編의 바탕을 마련해 놓았는데(南有定行狀, 南公轍 撰, 金陵集 卷19) 이들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대략 저자의 나이 60세를 전후한 시기쯤 이들이 함께 이 작업을 하였고, 70세 전후의 만년 작품은 南有定이 혼자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詩稿의 경우 詩體別로 편차하여 5권으로 만들었는데, 南有定에게 필사시킨 본을 가지고 1772년경 문인 李敏輔에게 산정, 교감하도록 하였다.(雷淵詩稿使我略揀旣卒業呈一篇謹要和詩, 李敏輔 撰, 豐墅集 卷5) 이 詩稿가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雷淵詩稿」(奎12241)로 보이는데, ‘精抄’라는 表題에 ‘有容德哉’라는 저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冊1~2는 古詩(1716~1769)와 拾遺, 冊3~5는 律詩(1716~1772)와 拾遺로 구성되어 있는데, 拾遺는 自編 과정에서 빠뜨린 것을 다시 정리해서 추가해 놓은 부분이다. 교정 내용을 보면, 두 사람 정도가 산정, 교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책1의 〈貍捉鷄〉 詩의 상단에 ‘曉來句刪恐似好’라는 교감 사항이 적혀 있는 옆에 다른 글씨체로 ‘誠然’이라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저자의 문인 兪漢雋이 저자 사후 1780년 여름에 남유정이 필사하고 이민보가 교정한 위의 본을 再校한 흔적으로 보인다.(答金丈孺文書庚子, 兪漢雋 撰, 自著 卷20) 이처럼 정리한 自編 文集을 저자는 張道純에게 필사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1778년 正祖의 문집 간행 명령이 내려진 뒤 정조가 乙覽한 본이다. 張道純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의 위항시인이라는 것 밖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아마도 저자의 문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저자가 1773년에 졸한 후에는 남유정도 곧 졸하고 아들 南公轍도 나이가 어려 문집의 간행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정조가 즉위한 뒤에야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다. 正祖가 처음 간행의 명령을 내린 것은 재위 2년째 되는 1778년 9월이었다. 정조는 당시 19세인 저자의 아들 南公轍을 召見하고 芸閣으로 하여금 저자의 문집을 간행해 주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本家로부터 遺稿(張道純寫本)를 넘겨받아 乙覽한 뒤 芸閣 提調로 하여금 校刊하도록 하였고, 이듬해 11월에는 諡號를 議定하도록 함과 동시에 芸閣으로 하여금 문집을 속히 인출하도록 재차 명을 내렸다.(年譜) 그러나 이때 곧 간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1783년 2월에 御製序文을 내리면서 간행을 다시 독촉하자 5월에 가서 30권 15책으로 문집 간행이 완료되었다.
1779년 이후 몇 년간 간행이 지연된 것은 芸閣 내부의 인쇄 사정도 있었겠지만, 本家에서 주도한 遺稿의 편차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自編 詩稿는 詩體別로 편차되어 있었는데 1781년경에 분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年代順으로 바꾸는 등 편차 과정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매부 金純澤이었고 본가의 후손 및 몇몇 문인들이 참여하였으며, 兪漢雋도 찬성하는 쪽이었다.(答金丈孺文書辛丑, 兪漢雋 撰, 自著 卷21) 金純澤 등은 自編 詩稿 5권을 연대순으로 재편하여 8권으로 만들면서 1772년~1773년 말년의 작품과 당초 自編 詩稿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작품을 넣기도 하고 더러 빼기도 하는가 하면, 註釋도 加減을 하고 詩題를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권8의 후반에 雜詩로 樂府, 詞令, 雜體, 聯句, 四言, 六言을 따로 모아 놓았는데, 대부분이 自編 詩稿의 拾遺에 들어 있던 작품들이다. 그런데 본집 초간본을 통해 보면 이때 재편된 내용에는 위의 「雷淵詩稿」에 표시된 산정, 교감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니, 金純澤 주도의 재편에 李敏輔와 兪漢雋의 의견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金純澤 등은 詩稿의 재편뿐만 아니라 文稿의 편차와 교정도 맡았는데, 초간본에서 文體別로 年代順 배열이 된 것을 보면 自編稿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한편 본집의 監印을 책임진 閣臣은 문집 간행 뒤 致祭를 위해 파견된 직각 徐鼎修였는데 그가 인쇄에 사용한 활자는 再鑄韓構字로써, 1782년(정조 6)에 族人인 평안 감사 徐浩修가 왕명으로 8만여 字의 韓構字를 再鑄하여 芸閣에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본집이 이 활자로 인쇄된 첫 印本인 셈이다.
결국 본집은 正祖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저자의 自編稿를 바탕으로 재편차되어 1783년에 芸閣에서 30권 15책이 再鑄韓構字로 간행되었다. ≪초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2900, 2921, 3603, 4827 등 다수), 장서각(4-5873),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3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83년에 한구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奎2900)이다.
| 키워드 | 영춘, 사군산수, 南有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