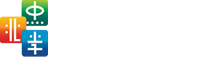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同舟覽勝記 |
|---|---|
| 분류 | 산수유기 |
| 시대/생몰년 | 1693년 夏初 |
| 형태 | 목판본(木版本) |
| 언어 | 한문 |
| 지역 | 영춘->단양 |
| 자료출처 | 蒼雪齋集 권12 |
저자의 사후 유문의 정리는 아들 權謩와 조카 權萬, 知友였던 密菴 李栽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李栽가 1725년에 쓴 行狀에 의하면 “저술로는 詩文 雜著 수십 권과 「退陶先生言行通錄」, 「溪門諸子錄」 등이 집안에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李栽, 權謩, 權萬 등이 문집의 校勘, 刪節 등을 의논하기 위해 주고받은 편지가 「密菴集」, 「江左集」에 실려 있는데, 1727년의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詩稿는 이미 勘定을 마쳤는지요. 이 본이 비록 手校를 거친 것이지만 반드시 세밀하게 檢精하여야 할 것입니다. 伯父의 시는 晚年 이전의 것은 가락과 풍치가 매우 높아 족히 후세에 남길 만한 것들입니다. …정밀하게 刪節하여 속히 精本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答密菴李公, 權萬 撰, 江左集 卷5) “先稿 9冊을 비로소 한두 번 校勘했는데 문자의 정밀함과 사리의 분명함은 참으로 요즘 보지 못하던 바였네. …遺稿의 去就와 刪節로 말하자면 손가는 대로 표를 붙여 놓았으니 재량하여 택하시게. 다만 아까운 것이 많아 산절한 것이 10에 2, 3에 불과하네. 詩稿의 경우는 즉석에서 붓가는 대로 쓴 것도 모두 一家를 이루었으니 더욱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고, 挽詩와 誄辭는 너무 많아 혹 표시해 놓았네.”(答權昌言, 李栽 撰, 密菴集 卷7)
이를 통해 볼 때 저자가 생전에 詩稿에 대해서만은 손수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詩錄에 있는 自註와 詩序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아들 권모가 문집의 수습과 편차를 맡고, 이재의 산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문집의 題名을 蒼雪로 하자는 논의와 저자의 墓誌銘, 文集序에 대한 글이 오간 것으로 보아 1728년경에는 본집의 정리가 완료되어 成書가 된 듯한데 간행에 대한 기록이 없다. 李栽의 서문(1728)에서도 저자의 文章에 대한 찬탄과 遺券을 考訂하였다는 편찬 관계 기록만 있을 뿐 간행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당시 저자의 문집보다 「退陶先生言行通錄」의 간행에 힘을 쏟았기 때문인 듯하다. 言行錄은 본집의 序文에서도 보이듯이 저자가 陶山書院의 洞主를 맡으면서 「退溪集」의 교정과 함께 착수한 일대 사업이었다. 이는 저자의 가장 큰 업적으로 추앙되면서 곧 嶺南과 京中에서 간행하자는 의논이 있어 金聖鐸이 院長으로 있던 虎溪書院에서 간행하기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으며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영조 연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한편 定齋 柳致明의 年譜에 의하면 純祖 32년(1832)에 유치명이 石泉精舍에 머물면서 蒼雪權公의 文集을 교정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며, 본집의 부록 끝에는 哲廟 庚申年(1860)에 유치명이 지은 柏麓里社奉安文과 常享祝文이 실려 있다. 이 봉안문이 실려 있는 21판과 22판은 板心의 형태와 글자가 조금 달라 나중에 추각해 후쇄한 듯한데 본집과 마모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집이 간행되고 얼마 안 되어 추각된 것으로 보인다. 즉 柳致明이 문집을 교정한 1832년에서 1860년 사이에 본집이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高宗(1864) 이후에 奉安文 등이 추각되어 후쇄된 것으로 추정된다.《초간본》 다만 앞에서 말한 대로 추각 부분과 본집의 쇄출 상태가 깨끗하여 마모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본집의 간행을 哲宗 연간으로 잡을 수도 있다. 이 목판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3648-文07-76),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100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松D1-A194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장서각에는 본집의 일부를 필사한 3권 3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본서의 저본은 19세기 중반에 목판으로 초간된 뒤 高宗 초년에 추각된 후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 키워드 | 영춘, 단양, 사군산수, 權斗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