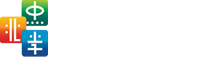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丹丘日記 |
|---|---|
| 분류 | 산수유기 |
| 시대/생몰년 | 1688년(숙종14) 3월 4~4월 7일 사군 유람: 3월 8~4월 5일 |
| 형태 | 활자본(芸閣印書體字) |
| 언어 | 한문 |
| 지역 | 양주-여주-충주-청 |
| 자료출처 | 三淵集拾遺 권27 |
저자는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않고 鐵原 三釜淵, 白雲山, 雪嶽山 등 곳곳에 卜居하면서 많은 詩文을 남겼다. 저자는 졸하기에 앞서 조카 金信謙과 아들 金致謙에게 文集의 刪定에 관한 遺言을 남겼는데, 이는 「三淵集拾遺」 卷31의 語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詩稿는 李秉淵과 洪世泰, 文稿는 魚有鳳에게 산정하도록 하고, 書札은 兪肅基, 魚有鳳, 朴弼周와 상의하여 取捨하라고 하였다. 특히 長書 가운데 스승 拙修齋 趙聖期와의 왕복 서찰은 번잡한 것이면 빼버리고 義理를 發明한 것이면 넣도록 하고 兪肅基에게 보낸 것은 魚有鳳과 상의하여 취사하도록 하였다. 또 墓道文字는 짓지 말고 行狀은 金信謙에게 짓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子姪과 門人에게 남긴 유언은 문집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편차된 것이 36권 18책이었다.
이 정고본이 芸閣活字로 간행된 것은 1732년(영조 8)이었다. 「年譜」에 의하면, 이해에 36권 18책이 완성되었고 문인 兪拓基가 慶尙道 觀察使로 있으면서 俸金을 내어 活字로 인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淸選考」와 「英祖實錄」에 보면, 兪拓基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것은 1726년(영조 2)과 1737년 두 번이었다. 兪拓基는 1726년에 경상도 관찰사로서 저자의 동생 金昌緝의 「圃陰集」을 芸閣活字로 간행한 바 있었는데, 「圃陰集」의 경우 저자가 생전에 편차하여 家藏해 두었던 것이어서 먼저 간행한 듯하다. 그리고 이어 본집의 간행도 추진하였으나 미처 마치지 못하고 이듬해 체차되었던 것이다. 곧 1727년은 정미환국이 일어난 해로 노론계열이 다수 축출되는 상황에서 유척기도 파면되었다. 그는 이후 楊州 牧使(1728), 江華 留守(1730)를 거쳐 1732년 4월에야 부제학 등 중앙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年譜」에서 말한 1732년은 유척기가 江華 留守로 있던 때였거나 아니면 부제학 등에 제수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江華의 경우 1699년에 저자의 부친 金壽恒의 문집 「文谷集」을 留守로 있던 아들 金昌集이 역시 芸閣活字로 간행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자료가 없어 본집도 그곳에서 간행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年譜」에 언급된 연도를 우선 믿고 경상도 관찰사가 강조된 것을 고려할 때, 본집은 문인 유척기가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내면서 마련한 재원으로 1732년에 완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초간본》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903), 장서각(4-6109),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8-文10-83),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47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35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 위의 「年譜」 기사에는 아울러 遺集 30권 15책이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遺集은 곧 현전하는 「三淵集拾遺」를 말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8-김창흡-삼-필-14)의 경우 表題가 三淵遺集이고 卷首題가 三淵集拾遺인 것에서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拾遺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하는데, 32권 16책의 연대본과 후손 金貴年씨 소장본, 25권과 年譜 합 17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46-가528), 26권 13책의 장서각장본(4-6110)이 있다.
「年譜」의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32권본은 기존의 30권본에 권31 語錄과 권32 附錄(遺事, 行狀, 請享石室書院書) 2권을 더한 것으로 후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권32의 請享石室書院書의 題下 小註에 ‘批見年譜’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은 「年譜」가 간행된 뒤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年譜」가 간행된 1854년경까지는 30권본의 拾遺가 家藏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2권이 첨가된 32권본이 필사된 것이다.
또한 권32의 附錄 가운데 遺事는 趙明履가 1732년경에 지었고, 行狀은 金亮行(金信謙의 子)이 1768년, 請享石室書院書는 문인 李修大 등이 1760년에 지었으니, 이 글들이 실리지 않은 30권본은 1732년경 原集이 간행되고 나서 곧 누락된 遺稿를 모아 편차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원집 간행 후 곧 편차된 30권의 拾遺에 1854년 이후 附錄 성격의 2권이 첨가된 것이 오늘날 전하는 32권본인 듯하다. 32권본에는 모두 校正 본 흔적이 남아 있고 특히 金貴年씨 소장본은 罫印淨寫本인 것을 참작할 때 간행을 염두에 두고 필사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필사 연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습유》 한편 김귀년씨 소장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3646-19-1-c.3)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 25권과 연보 합 17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은 권1~8이 詩, 권9~15가 書, 권16이 序, 記, 권17이 題跋, 說 등, 권18이 墓誌銘, 行狀 등, 권19~21이 祭文, 告文, 雜錄, 日錄, 日記, 권22가 漫錄, 권23이 太極問答, 권24가 語錄, 권25가 附錄이고 年譜가 합부되어 있다. 32권본의 권9~12의 詩와 권13~14의 書가 누락되고 권19~20의 書가 권13으로 합쳐져 있는 것이 다를 뿐, 다른 편차와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26권 13책의 장서각장본은 25권본에 비해 詩 2권이 첨가되고 太極問答이 누락되어 있다. 결국 이 두 본은 누군가가 32권본에서 取捨하여 筆寫해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年譜」는 1854년(철종 5)에 종5대손 이조 판서 金洙根이 全史字로 2권 1책을 간행하였다. 저자의 현손 臺山 金邁淳(1776~1840)이, 누대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모아 편집하고 金亮行이 지은 行狀, 자신이 지은 墓誌를 附錄으로 붙여 편차해 놓았던 것을 金洙根이 이때 와서 간행한 것이다. 金洙根은 자신의 5대조인 金昌協의 문집 「農巖集」 續集 2권과 金昌協의 증손인 金履安의 문집 「三山齋集」을 全史字로 간행하면서 아울러 이 「年譜」까지 간행하였다.《연보》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1987년 民族文化社에서 출판한 「韓國人物史料叢書」 제10권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원집은 1732년에 운각인서체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고, 습유는 1854년 이후 書寫된 罫印淨寫本으로 후손 金貴年씨의 소장본이다. 저본 중 卷4의 제15판은 卷次가 ‘三’으로 誤記되어 있다.
年譜, 年譜跋(金洙根 撰), 圃陰集跋(金信謙 撰) 등에 의함
| 키워드 | 사군산수, 金昌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