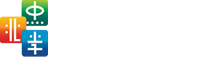상세보기
| 명칭 | 巴東紀行 |
|---|---|
| 분류 | 산수유기 |
| 시대/생몰년 | 1664년(현종5) 정월 21일~5월 2일 사군 유람: 4월 24~27일 |
| 형태 | 목판본(木版本) |
| 언어 | 한문 |
| 지역 | 지평-영월-금강산- |
| 자료출처 | 記言別集卷 9권 |
본집은 目錄과 原集 20권, 續集 3권, 別集 1권, 附錄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서발은 없다.
原集 권1~2는 詩이다. 총 330여 수의 많지 않은 분량을 詩體에 관계없이 연도순으로 편차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전형적인 性理學者로서 스스로 觴詠은 내 일이 아니라고 했던만큼 詩作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내용은 주로 저자의 형제들과 兪棨, 宋時烈, 李惟泰 등 교분이 깊었던 諸賢들과의 차운시이고, 이 중 40여 수가 스승인 愼獨齋 金集을 비롯해 兪棨, 趙翼 등에 대한 挽詩이다. 시를 짓게 된 동기나 인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自註를 붙여놓은 것이 많으며, 권2에는 1664년 金剛山과 關東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시가 많다.
권3~4는 38편의 상소로 역시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다. 1653년 咨議를 사직한 상소로부터 1669년 온천에서의 召命에 대한 待罪疏까지 대부분 사직소와 진정소이다. 끝에는 특별히 병자년(1636)에 올린 3편의 소가 실려 있다. 〈太學請斬虜使疏〉는 태학생으로서 疏頭가 되어 淸의 사신을 베고 和議를 배척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강직하다는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된 소이다. 저자는 丁丑年(1637)에 江都에서 失節했다는 죄를 자처하여 평생 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정책의 논의나 時務에 대한 소는 없다. 〈辭持平江外陳情疏〉는 孝宗의 召命이 있자 果川과 궐밖까지 와서 올린 것인데 江都의 일을 깊이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5~12는 총 270여 편의 書이다. 편지는 저자의 글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한 부분이다. 많은 편지들에 小字雙行으로 自註가 달려 있으며, 인용한 글은 전거를 기록해 놓았다. 또 대부분 주제를 바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아들 尹拯이 본집을 편차하면서 앞뒤의 형식적인 안부 등의 衍語를 산삭했기 때문이다. 편지를 보낸 대상은 대체로 스승인 金集과 동료인 宋時烈, 宋浚吉, 兪棨, 李惟泰, 權諰, 鄭瀁, 朴世采 등이며 그 밖에는 형제와 자제들이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보내는 대상에 따라 분류되며 또 대상의 신분에 따라 수록 순서가 정해지는 편인데 본집에서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편차한 것이 특징이다. 즉 특정 시기나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는 편지는 내용별로 분류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안부나 개인용무에 관한 편지는 일반적인 편차방식을 따라 배열하는 이중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이는 「朱子大全」의 구성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권5는 1656년~1659년 사이 宋浚吉, 李敏迪, 金集 등에게 보내어 자신이 上京하여 상소하는 본뜻을 설명하면서 出處의 道와 江都 사건에 대해 논한 것인데, 시기순으로 편차하여 저자의 생각과 주위의 의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권6은 時事와 出處에 대해 논한 것이고, 권7과 권8은 인물에 대한 논의로 牛溪 成渾과 그 제자들, 그리고 尹善道, 成文濬, 崔永慶 등에 대한 논의이다. 권9~10은 禮論에 대해 愼獨齋, 宋浚吉 등과 문답한 편지만을 모은 것이다. 권11~12는 일상적인 편지로 인물별로, 또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시대순으로 편차하였는데 스승인 金集에 대한 글을 가장 앞에 두었고 교분이 깊었던 친구들, 그리고 제자와 가족순으로 배열하였다.
권13~16은 雜著이다. 권13은 〈後天圖說〉과 그에 대해 兪棨와 왕복한 편지를 따로 실어 놓았다. 권14는 저자의 외조부인 成渾에 대한 글과 金集, 金尙憲 등에 대한 遺事이다. 이 중 牛溪年譜는 栗谷年譜와 함께 간행되었기 때문에 제목만 실었으며 年譜後說은 成渾이 무함을 받은 일에 대한 변론을 문답식으로 구성해 君子出處의 道를 논한 것이다. 권15는 일기로 1652년 4월부터 1657년 4월까지의 일기이다. 일기의 몇 조항은 續集과 別集에도 나누어 실려 있다. 孝宗을 무함하였다고 문제가 된 곳은, 바로 을미년(1655) 12월 江都의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부분과 정유년(1657) 尹鑴와 江都의 일에 대해 問答한 부분이다. 권16은 說(2), 記(1), 序跋(4)과 上樑文(7), 通文(2)이다. 조카 尹拭과 兪棨의 아들인 兪命弼의 字說을 비롯하여 送序(2)와 遯巖書院, 臨陂書院의 上樑文이 실려 있다. 또 아들 尹拯과 尹推의 혼인시 지은 納幣書가 있다.
권16~20은 祭文과 墓誌文, 行狀이다. 제문은 저자가 옮겨살던 美村의 土地神에게 올린 제문을 비롯하여 仲兄 尹舜擧의 제문까지 모두 27편이 실려 있다. 墓誌는 친족의 것이 대부분으로 10편이며, 행장은 절친했던 벗인 兪棨의 行狀이 1권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권20은 金沔, 權儁, 尹集, 尹坤의 행장이다.
續集은 3권으로 권두에 목록이 있으며 기본적인 구성은 원집과 같다.
권1은 詩, 疏, 書이다. 65편 가량의 시가 詩體에 관계없이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부분 挽詩이다. 疏는 1660년~1662년 辭職疏와 1665년, 1666년 顯宗이 溫泉에서 소명을 내린 데 대한 待罪疏이다. 書는 宋時烈, 宋浚吉, 權諰와 아들에게 보낸 것이다. 〈答權思誠戊戌〉은 1658년 궐하에 나가 疏를 올린 자신의 뜻을 친구이자 사돈인 權諰에게 토로한 것인데, 내용 중 ‘作今日之杜擧’란 대목이 또한 효종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외에 〈答鄭晏叔〉은 鄭澈의 후손인 鄭瀁에게 己丑獄事의 일을 둘러싼 成渾과 鄭澈의 오해를 설명한 것이고, 〈與李方伯〉은 黃愼의 祠宇 문제를 논한 것이다.
권2는 〈書松江邪正辨後示宋李諸益〉은 己丑獄事에 대한 글이다. 저자는 牛溪의 外孫이었는데, 己丑獄事를 둘러싸고 成渾(坡山) 門下와 金長生(連山) 門下가 불화하게 된 것은 鄭弘溟(鄭澈의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당시의 是非에 대해 대단한 관심이 있었다. 〈兩先生師友錄目錄〉은 成渾, 李珥의 門人錄이다. 이 밖에 通文과 祭文 등이 있으며 단편적인 日記 7조목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주로 인물평과 수학하러 온 제자를 거절한 것이다.
권3은 巴東紀行이다. 1664년 형 尹舜擧와 함께 關東 일대를 유람한 기행일기이다.
別集은 1권으로 詩 17편과 書 15편, 日記 3조이다. 시는 宋時烈, 尹鑴 등과 수창한 詩이다. 〈擬答宋英甫〉는 일명 己酉擬書로 불리는 편지로, 1669년 저자가 졸하기 직전 尹鑴의 문제로 宋時烈에게 보내려다 그만두었는데, 후에 아들 尹拯이 宋時烈에게 저자의 묘도문을 부탁하면서 보여 주어 결정적으로 불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편지이다. 또 尹鑴와 주고받은 편지 4편이 실려 있는데 이 또한 당시의 忌諱하는 바였기 때문에 시와 아울러 別集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日記 3條도 모두 尹鑴와 관련된 글로 그가 자신의 後天說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등 윤휴를 인정하는 내용들이다.
附錄 上은 아들 尹拯이 편차한 年譜와 遺事, 그리고 江都에서 殉節한 夫人李氏의 遺事이다. 부록 下는 1673년 朴世采가 지은 행장과 형 尹元擧가 지은 墓表陰記, 그리고 祭文과 挽詞이다. 송시열이 지은 묘비명은 실려 있지 않다. 뒤에는 저자가 배향된 魯岡書院과 新谷書院의 제문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魯西先生世系圖가 있는데 증손인 尹東洙, 尹東源의 항렬까지만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원집 발간시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 사군산수, 尹宣擧 |
|---|